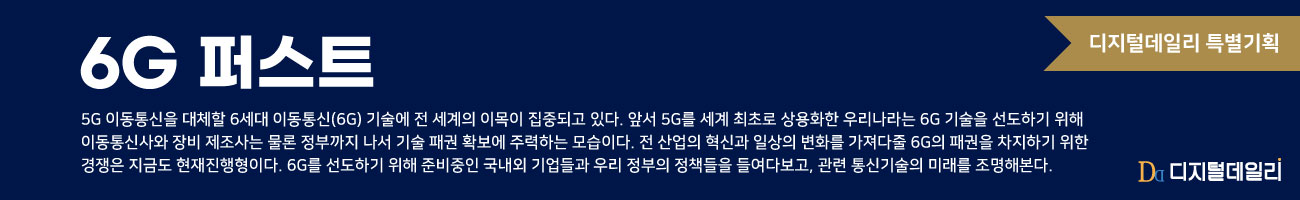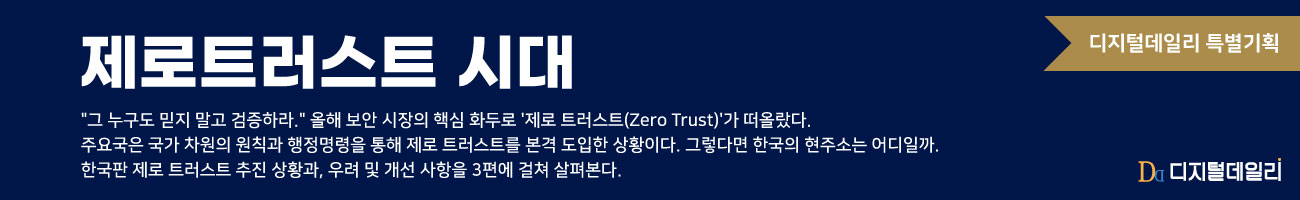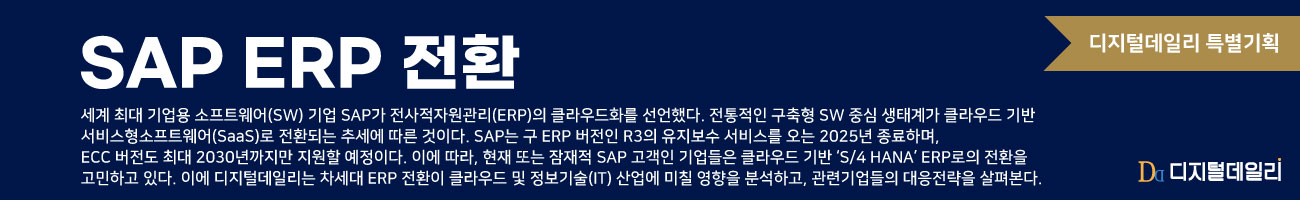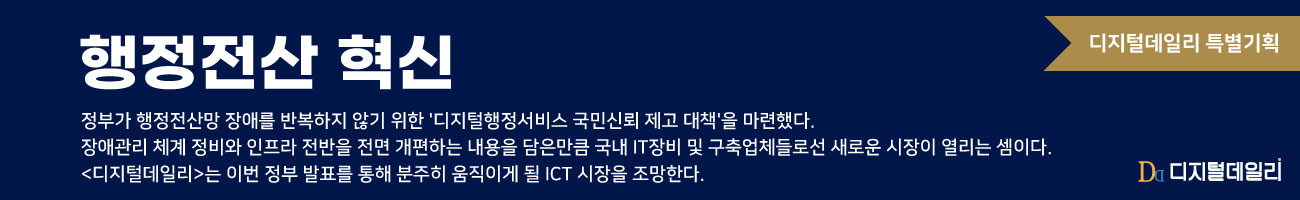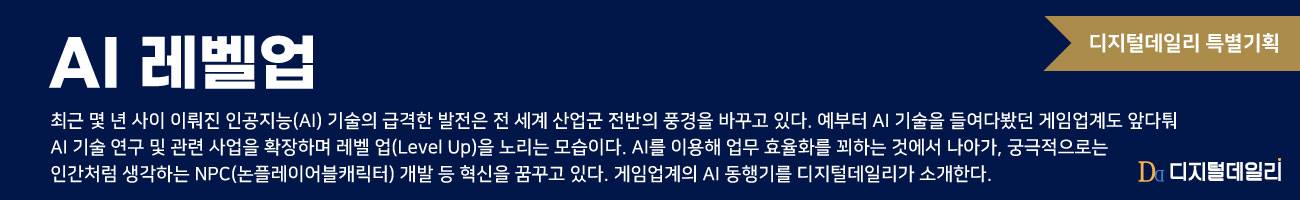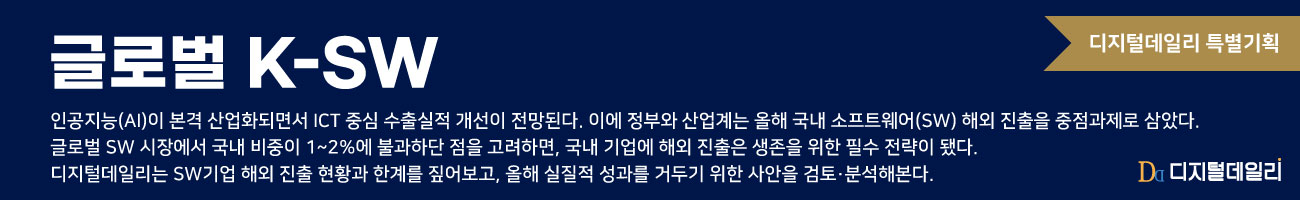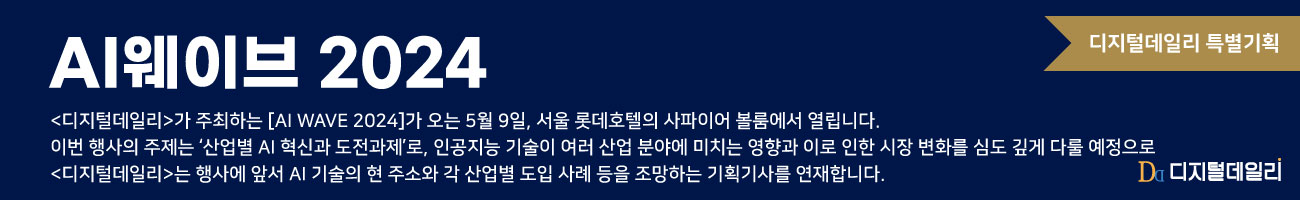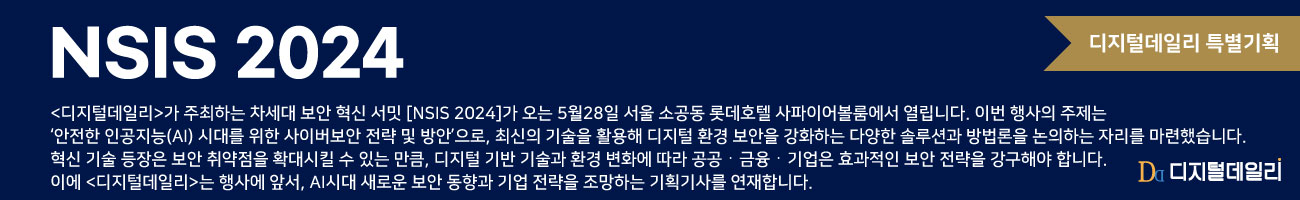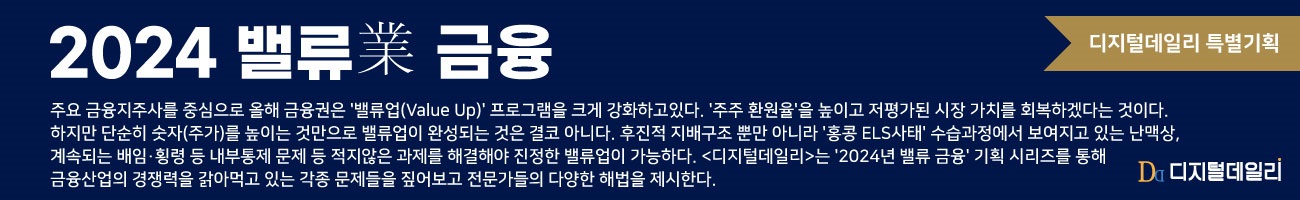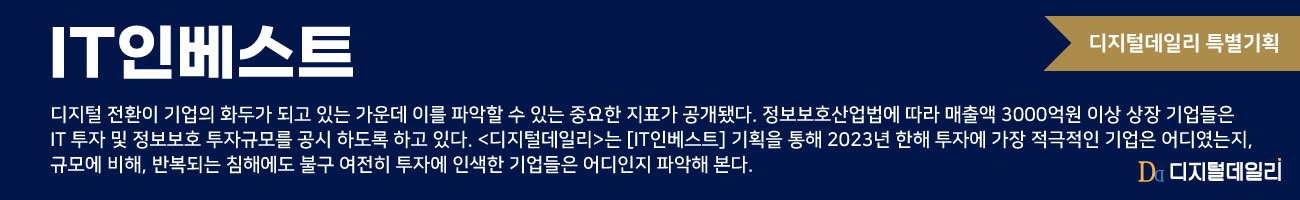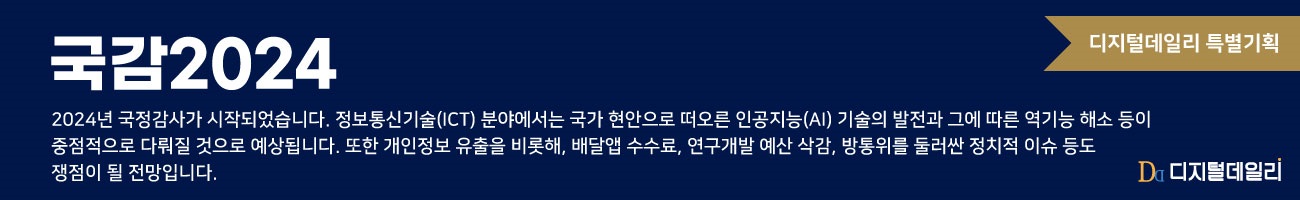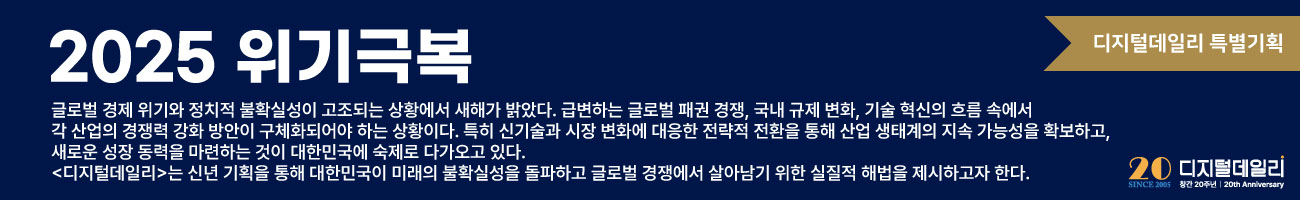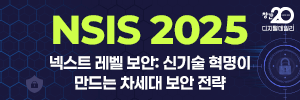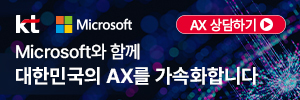'아이폰' 관련 美 생산품 5%뿐…글로벌 공급망 벗어나기 '산 넘어 산'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아이폰 미국 생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은데, 실제 이를 단기간에 현실화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8일(현지시간) 외신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은 아이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깊이와 복잡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고도의 제조 역량이 애플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비교적 자세한 분석 내용을 전했다.
애플은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약 2억8000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구축된 공급망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좇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대만 TSMC,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수백 개에 달하는 중국·동남아 부품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얽힌 ‘초정밀 글로벌 제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아이폰 한 대는 약 2700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며, 28개국, 187개 부품 공급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미국 내 생산 부품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IDC의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 부활’을 구호로 내세우며 애플의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높다.
우선 비용 문제가 크다. 해외 리서치업체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완전 조립할 경우 단말기 가격이 약 35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아이폰 16 프로(256GB 기준) 모델이 약 36%의 순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수준이다.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주로 공급하며, 프로세서는 TSMC가 대량 공급하고 있다. 프레임 가공에 필요한 CNC(컴퓨터 수치제어) 설비와 숙련 엔지니어 역시 중국에 집중돼 있다. 심지어 74개의 초소형 나사까지 중국·인도에서 주로 생산되며,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고숙련 인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에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불거진 희토류 의존도도 문제다. 아이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희토류 원소의 약 70%는 중국에서 수입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희토류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애플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생산거점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인도에서는 미국 판매용 아이폰 전량 조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글로벌 아이폰 생산량의 20%를 인도에서 조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 역시 부품 공급망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 대만,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애플 최대 생산 파트너인 폭스콘(Foxconn)은 중국 정저우 아이폰 시티를 비롯해 대규모 제조 클러스터를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조립·검수·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인접 거리에 밀집돼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미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길 경우, 이러한 집적효과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품질 관리와 생산 속도, 원가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주요 외신들은 애플 역시 향후 수년간은 중국 중심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IPX, ‘서울스프링페스타’ 참여…명동부터 타임스퀘어까지 라인프렌즈 알린다
2025-04-29 17:36:00 -
'SKT 유심 해킹' 불안 증폭… 금융 당국, 30일 오전 비상대응회의 개최
2025-04-29 17:35:17 -
게임산업 위기론 고조…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역량 ‘시험대’
2025-04-29 17:32:41 - 2025-04-29 17:25:46
-
SKT 유심 해킹 여파…국방부, "장병 유심 교체 대책 마련"
2025-04-29 17: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