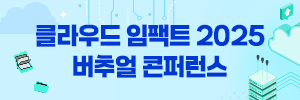韓 장비업체, 해외 매출 ‘급증’…中 반도체 굴기 가속화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장비 매입을 늘리는 등 투자 규모를 키웠다. 낸드플래시에 이어 D램 생산이라는 성과를 냈다. 반도체 업체 수도 지속 증가, 외실과 내실 모두 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등 주요 장비업체들의 해외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외 중국 반도체 업체다.
화학기상증착(PECVD) 장비 등을 양산하는 원익IPS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3895억원으로 전년(954억원)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저압화학기상증착(LPCVD) 장비 및 전구체 등을 공급하는 유진테크는 846억원에서 1044억원으로 상승했다. 테스는 388억원에서 630억원, 주성엔지니어링은 중국 매출 비중이 12.8%에서 68.8%로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매출도 일부 포함됐지만, 지난해 투자가 많지 않던 점을 미뤄보면 중국 업체 물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와의 수주 계약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자체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는 만큼, 향후 중국 관련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YMTC), 푸젠진화반도체(JHICC) 등이 이끌고 있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업체 중 처음으로 D램 판매를 개시했다. 그동안 양쯔메모리 모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이 D램 양산을 시도해왔지만, 아직 공식화하지 못했다.
창신메모리는 1세대 10나노급(1x) 공정을 통해 PC용 8기가바이트(GB) DDR(DoubleDataRate)4, 스마트폰용 2·4GB LP(LowPower)DDR4 등을 만들고 있다. 1x는 10나노미터(nm) 후반대다. 현재 D램을 양산하는 팹1 외에 팹2, 팹3 등을 연이어 구축해 생산능력(CAPA, 캐파)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D램은 별도의 캐패시터(데이터 저장소)가 존재, 낸드처럼 적층이 어렵다. D램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 양산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몸집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는 SMIC를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설계(팹리스)는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칭화유니그룹의 유니SOC 등이 이끌고 있다. 팹리스 업체 수가 지난해 1700개를 넘어서면서, 국내 규모와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커졌다.
아직 국내 업체와의 격차는 여전하다. 메모리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세대 10나노급(1z) 공정을 적용한 16기가비트(Gb) DDR4 D램 개발 및 양산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기술인 극자외선(EUV) 공정을 파운드리에 이어 D램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중국 반도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공세는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산업에서 파급력을 과시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국가다. 기존 자체 소화력은 15%에 불과하지만, 화웨이 사례처럼 자국 업체 구매 정책을 펼치면, 반도체 업계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실적 개선은 막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힘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 -
KT클라우드, 업스테이지·리벨리온 등과 ‘AI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2025-04-18 17:42:17 -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AI 네이티브, 데이터의 숨은 가치부터 찾아야”
2025-04-18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