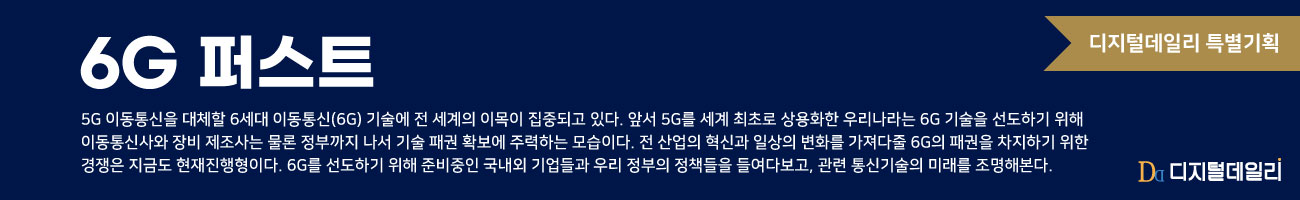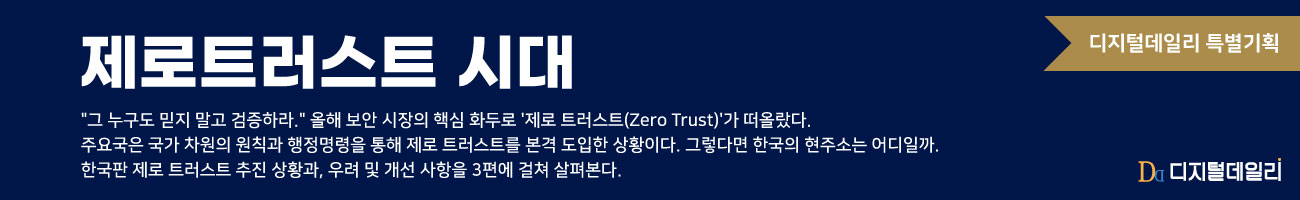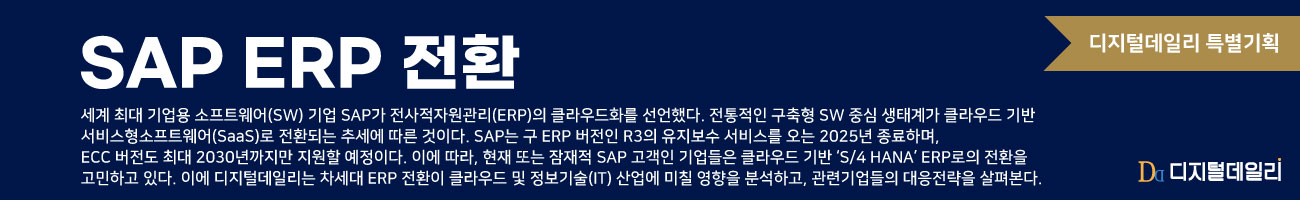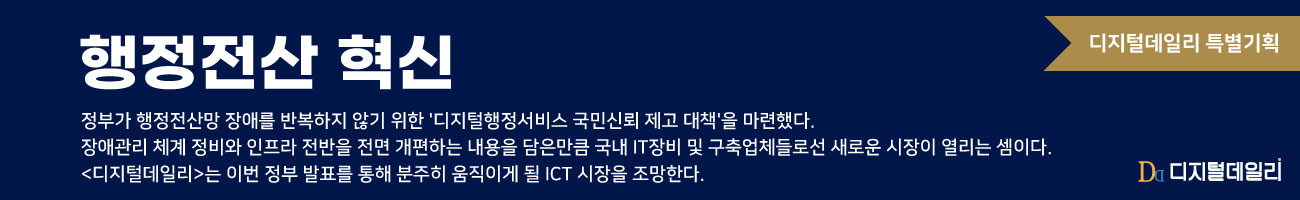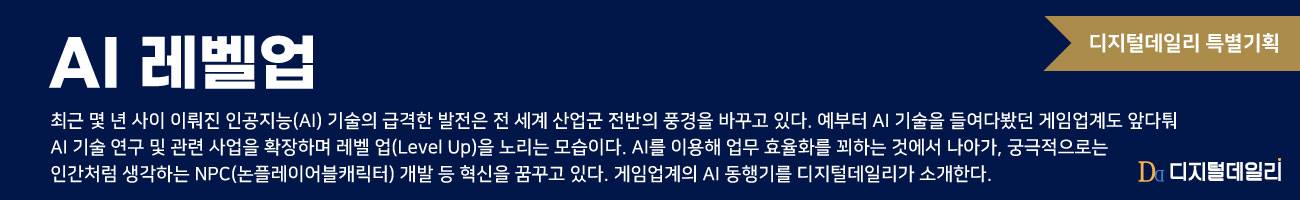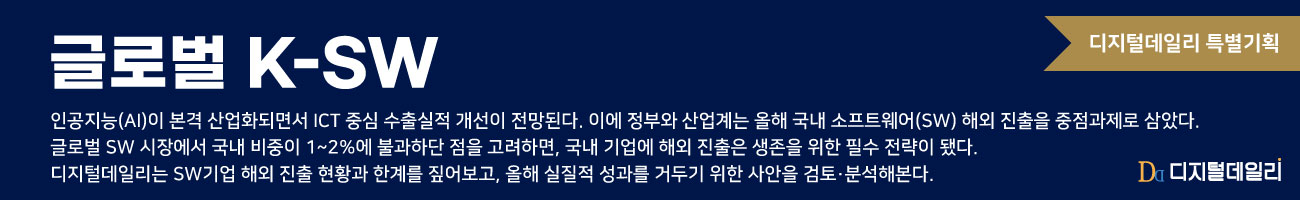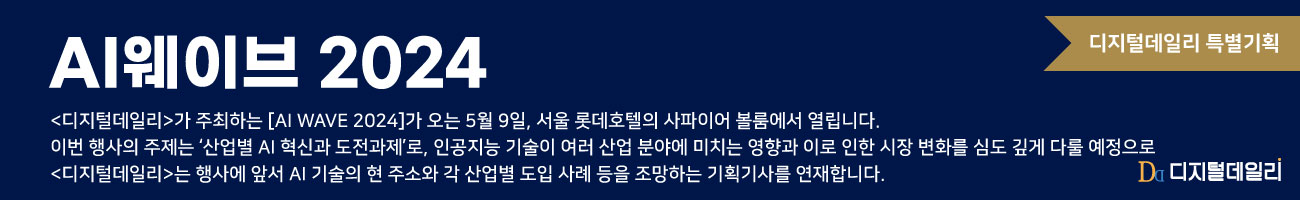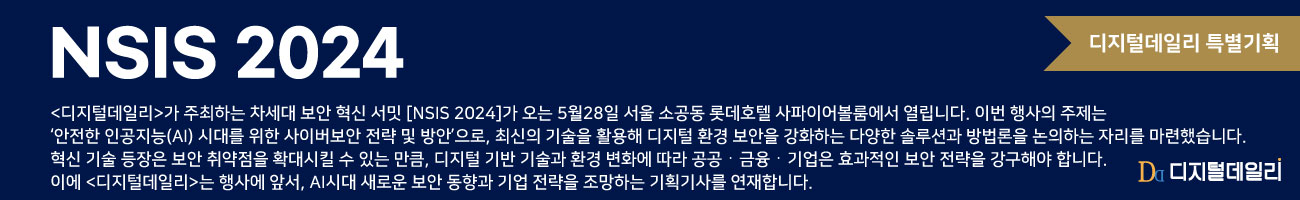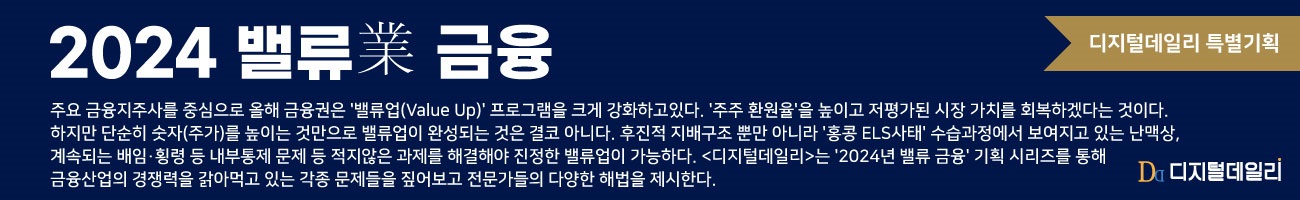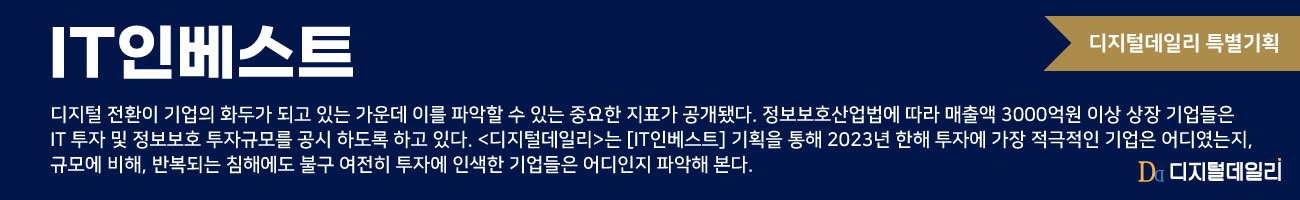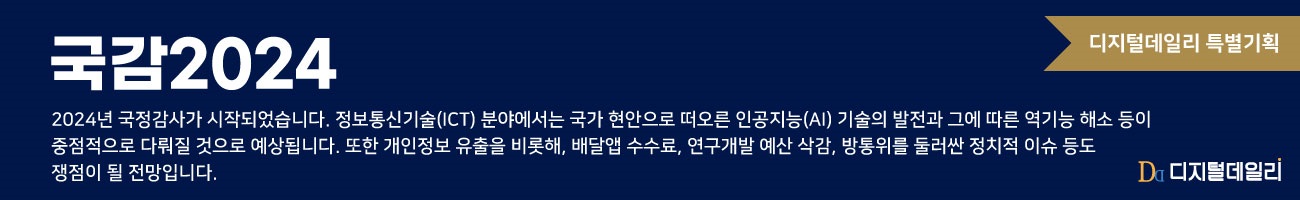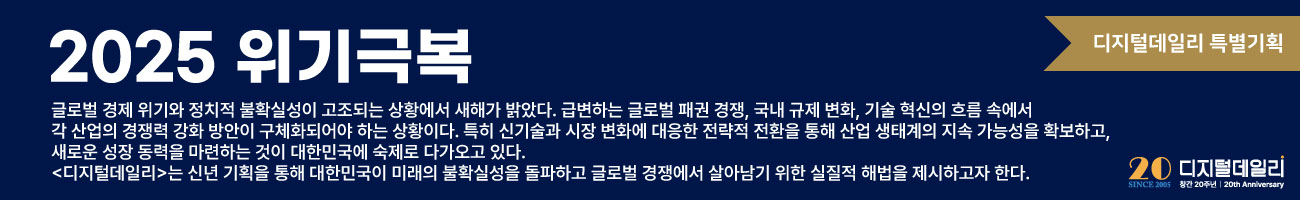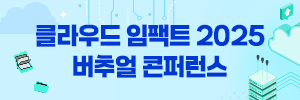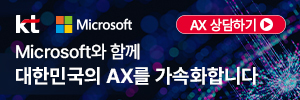[테크다이브] '유리기판'은 첫 단추가 아니다?...선행 과제로 지목되는 '실리콘포토닉스'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모으고, 분석하고,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곧 연산 효율과 전력 소모, 더 나아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진화를 상징하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작 선행 과제로는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아닌 실리콘 포토닉스가 진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기판이 각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유기기판 대비 더 얇고,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며, 열팽창 계수(CTE)가 칩과 유사해 고성능 반도체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나 고성능 컴퓨팅칩을 묶는 고밀도 인터포저 기술의 대체재로 떠오르며, 삼성전자, 인텔, LG이노텍, 삼성전기, 대덕 등 국내외 기업들도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도 눈에 띕니다. 인텔은 가장 먼저 유리기판 기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상반기 중 시제품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LG이노텍도 최근 구미 공장에 시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유리기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외에도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며 차세대 기판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들은 유리기판 시장이 2023년 약 2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20억달러 이상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개념도. [ⓒSK하이닉스]](https://www.ddaily.co.kr/photos/2024/07/02/2024070215591239883_l.png)
하지만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칩과 기판 간 연결에서 신호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기술입니다. 그러나 칩과 기판은 물리적으로 밀착된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 손실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호 손실이 심각한 구간은 칩+기판에서 시스템 보드, 즉 서버나 장치로 연결되는 중간 거리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미세 전류가 구리선 내에서 열로 소모되며, 속도 저하와 전력 낭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리기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기술 과제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꼽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존의 전기 신호 대신 광(光) 신호를 활용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광신호는 전기 신호 대비 손실이 적고, 수백 기가비트(Gbps)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에 매우 적합합니다.
전기 신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광을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 기반의 광소자를 칩에 집적하거나 모듈화해, 시스템 간 연결에서 신호 손실을 줄이고 전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인텔,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등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와의 연결 최적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광소자를 칩에 집적하기 위한 공정, 수광부의 효율성, 모듈과의 정밀 정렬 등 많은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만으로는 전기적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AI 반도체 시대를 향한 전장(前場)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패키징의 밀도를 높이는 '수평적 진화'라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데이터 전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직적 혁신'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유리기판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데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효율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어떤 기술이 먼저 상용화의 문을 열게 될지 주목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 - 2025-04-19 12:36:35
-
[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