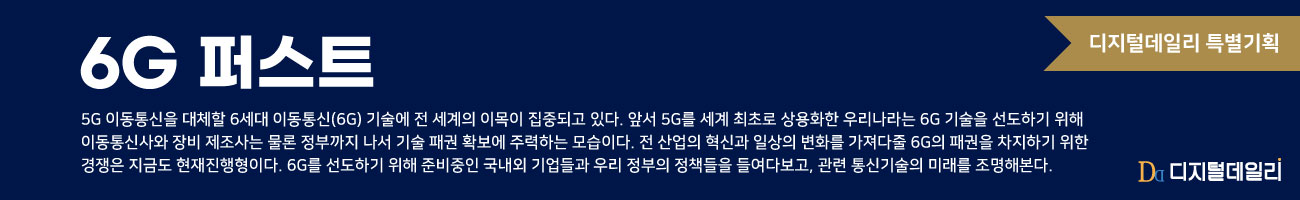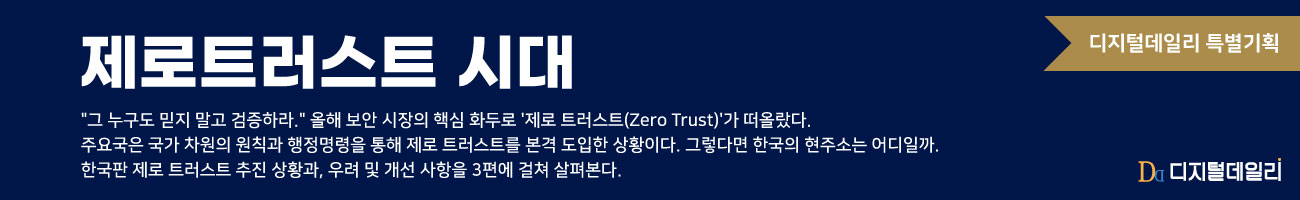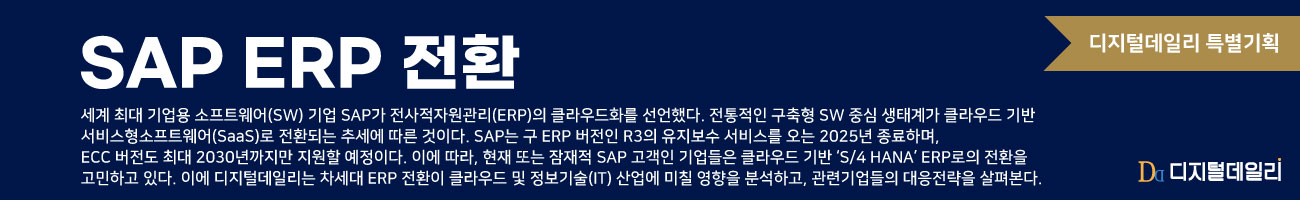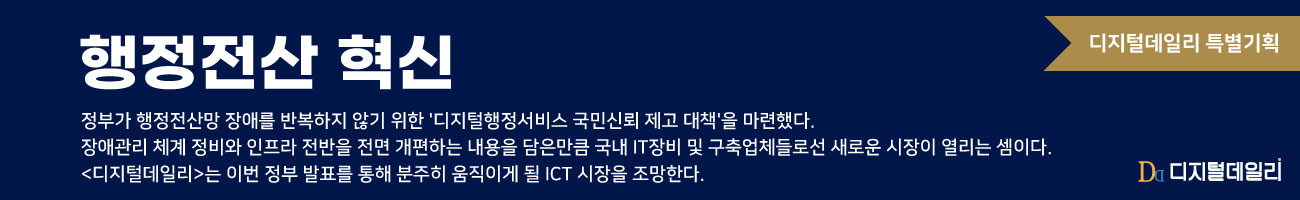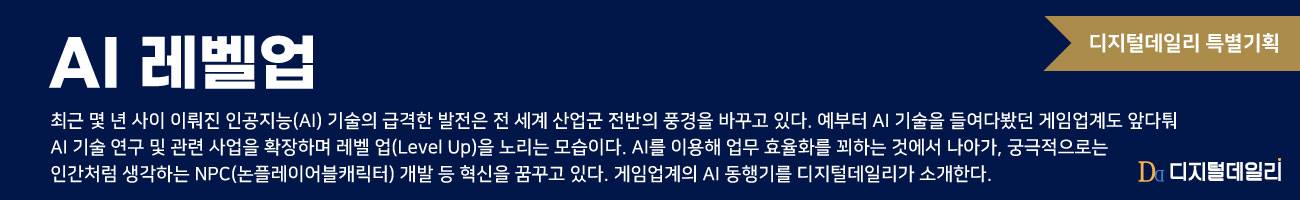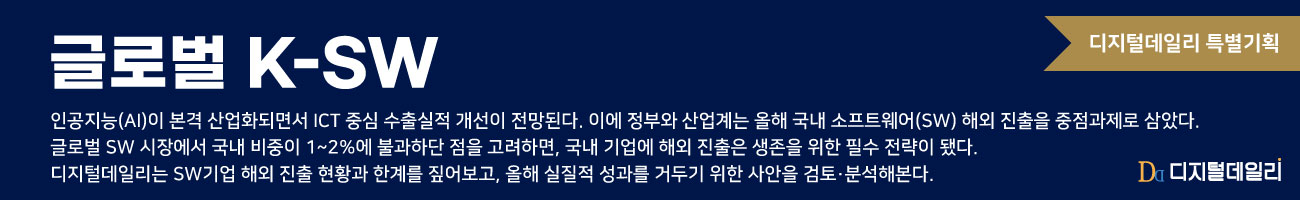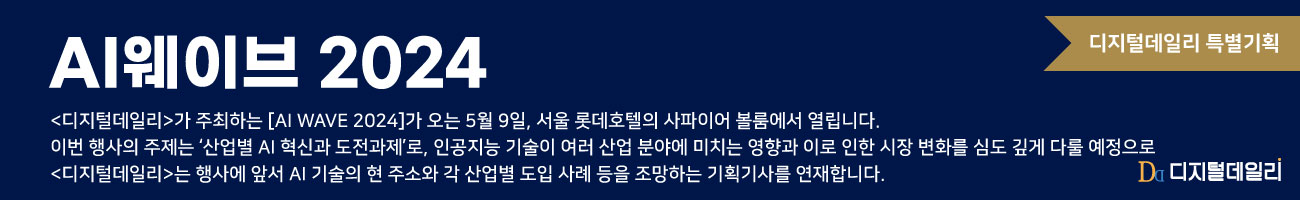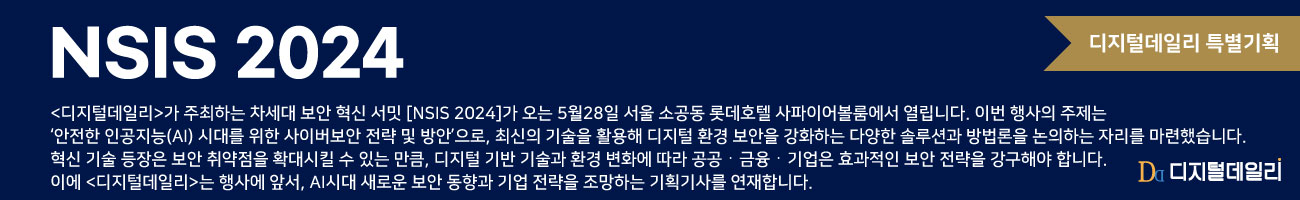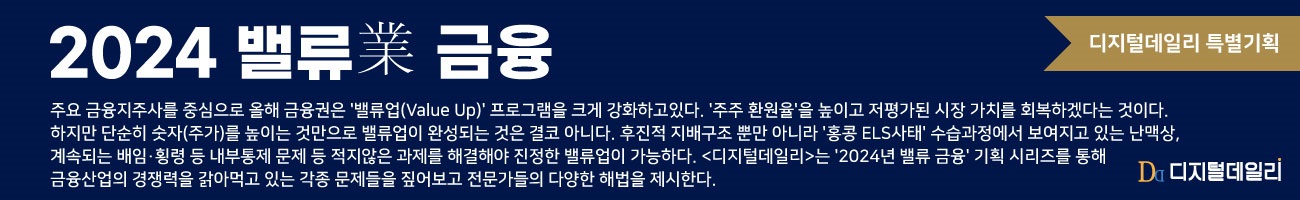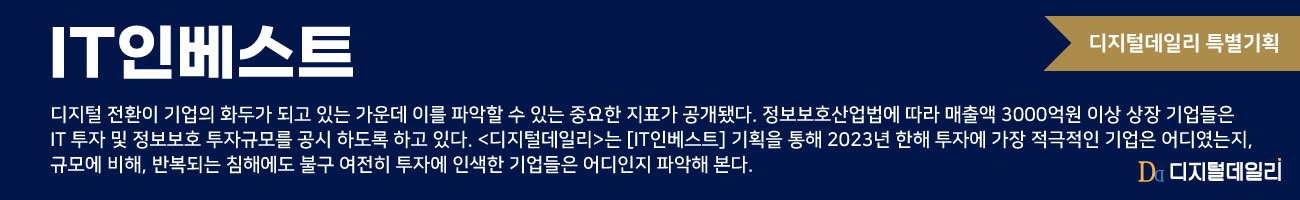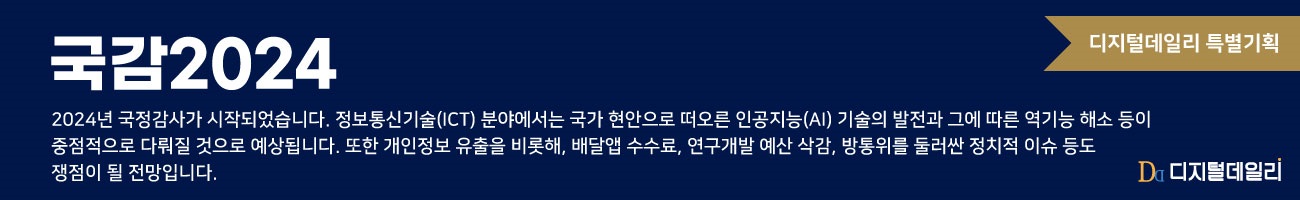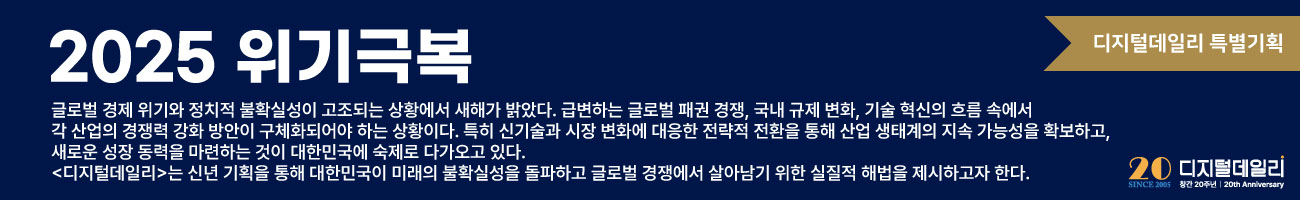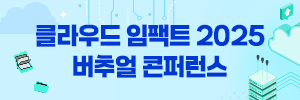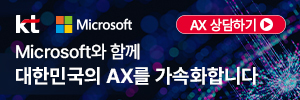美 관세 리스크 온다…K-배터리 장비 반입 현황은 [소부장박대리]
- 가
- 가
![얼티엄셀즈 3공장 전경 [ⓒ얼티엄셀즈]](https://www.ddaily.co.kr/photos/2024/12/09/2024120916075960308_l.jpg)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품목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업체가 현지화를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미칠 영향은 없지만, 유예된 관세가 시행된다면 장비 반입이나 소재 수입 등의 부정적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상호관세에 대한 영향 파악과 미국 진출에 대한 속도조절 등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일정에 맞게 진행하되, 관세 영향을 고려해 장비 반입이나 투자 시기를 조절하는 등도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 홀랜드 단독 공장에 대한 전환 투자와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다. 리튬인산철 에너지저장장치(LFP ESS) 용도로 확정한 2동의 경우 장비 반입이 거의 완료돼 전환 작업에 들어갔고, 3동은 현재 설비 반입 및 설치가 한창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 동은 연산 5기가와트시(GWh)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관측된다.
얼티엄셀즈(GM 합작법인)로부터 인수한 랜싱시 공장은 2개 동 중 하나의 동에 대한 장비 반입이 완료됐다. 해당 라인은 도요타로 향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나머지 한 개 라인은 아직 장비 반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SDI는 현재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조율 중이다. 초기에는 4개 라인, 트럼프 정권 이후에는 3개 라인 투자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고성능 NCA 각형 모델인 사이드 터미널 배터리 생산용으로 3개 라인을 투자하되, 수요와 시황에 맞춰 1개 라인을 추가 증설하는 '3+1' 구성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삼성SDI는 상반기 중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장비 발주서를 내고 설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삼성SDI의 미시간주 배터리 팩 조립 공장,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삼성SDI]](https://www.ddaily.co.kr/photos/2023/06/13/2023061323580891262_l.jpg)
배터리 업계에서는 국내 셀 제조사의 미국 현지 법인 투자 시기가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부과 여부에 따라 현지 법인에 투입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하는 셀의 경우 관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소재와 장비는 관세가 적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 투자 속도가 빨라져 장비에 대한 관세 영향을 피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배터리 3사는 당장 투자 속도에 변화를 주지는 않되, 정책상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부각된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살아나지 않는 탓에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제 투자를 단행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고정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품목별 관세 적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재나 장비 반입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 있지만, 현지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AMPC) 등을 고려할 때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 대비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오히려 없는 수요에 일찍 투자하는 것이 배터리사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확실한 시장과 보급형 확대에 따라 ESS 및 LFP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투자할 미시간주 랜싱시 공장 4동, 인수한 얼티엄셀즈 3공장의 나머지 한 동에 대한 용처를 확정하지 않았다. 높아지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를 고려해 LFP 기반 ESS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SDI 역시 3개 라인 외 나머지 1개 라인에 대한 용처를 미확정한 상태다. GM과의 합작법인인 만큼 전기차용 NCA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나, 전기차용 LFP 배터리 및 ESS 용도로의 검토 역시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높아지는 미국 내 전력 수요와 중국 진입의 어려움, 관세 등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관세 적용이 90일간 유예되고, 국내 정부와의 협상 등이 남은 만큼 상반기 중 용처가 정해질 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이젠 기업이 선택받는 시대…초핵심 인재 확보가 성패 가른다"(종합)
2025-04-22 17:51:03 - 2025-04-22 17:39:15
-
[DD퇴근길] "11일만에 매출 100억"…넷마블, 'RF온라인'으로 재도약 시동
2025-04-22 17:09:02 -
LG전자,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전장공급 역량 인정"
2025-04-22 17:00:00 -
"5월 출시 예정 상품을 미리 공개"… 삼성화재, ‘언팩 컨퍼런스’ 개최
2025-04-22 16: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