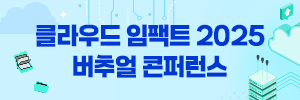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SKT 40년] ② 여름천막 속 ‘피 땀 눈물’…세간살이 독립경영 “해냈다”
- 가
- 가
전세계 내노라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총출동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에서 올해도 SK텔레콤은 메인홀 중심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글로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통사를 넘어, AI 컴퍼니로 또 다른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거 40년을 조망해보고 미래 ICT 개척자로서 SK텔레콤의 비전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1984년 여름.
서울 성동구 구의동 광장전신전화국 근처 중앙무선전신국 마당.
천막을 둘러친 임시건물 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기를 반복할 때도 이 천막의 불을 늘 밝게 켜져 있다. 임시 천막인지라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찜통 그 자체다. 게다가 계절은 여름. 비오듯 흐르는 땀을 훔치며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해내고 또 해내도 일은 늘 쌓여만 간다. 끝이 없는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일손이 딸리니 어쩔 수가 없다.
현장이 아닌 회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청사는 커녕 변변한 사무실도 없다. 광장전신전화국 2층에 40평 남짓한 공간이 전부다. 그것도 세간살이였다. 32명이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는 했으나 밀려드는 일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1984년 3월 29일 첫 업무를 시작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텔레콤)의 그 해 여름 모습이다.
정말이지 경쟁사와 비교하기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시작이었다. 정부가 2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을 전부 출자해 3만5천87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는 시작부터 재계 12위로 출발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0억원, 삼성과 금성(현 LG) 등 국내 내노라하는 재벌기업을 포함해 민간이 43억8천만원을 들여 총 63억8천만원의 자본금을 투입한 한국데이터통신(현 LGU+)과도 비교불가 수준이다. 이와 달리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수권자본금 5억원,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의 세간살이로 시작한 작은 IT벤처기업과 다를 바 없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출범
1980년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을 국가산업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 마련에 분주했다.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을 신성장 산업으로 전면배치하기 위해 ‘통신사업 경영체제 개선방안’을 작성했고, 대통령 재가에 따라 1981년 3월 14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정을, 1981년 12월 10일 체신부의 전무국 등을 따로 때어내 ‘한국전기통신공사(KTA, 현 KT)를 창립시켰다.
이 후 체신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함께 통신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이동전화 실현을 위해 미국서 개발된 셀룰러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1982년 10월 ‘이동무선전화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세계 4번째로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를 도입했다.
당시 대표적인 이동전화는 자동차다이얼전화로 ‘카폰’이라 불렸다. 특권층만 쓰던 카폰을 일반인에게도 확장하겠다는 목표는 1983년 11월 ‘자동차다이얼 전화보급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됐다. 1984년 1월 1차 수도권 지역 3000대, 2차는 연말 5000대를 보급해 첫 해만 총 8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38억원을 투입, 도심지 고층빌딩전화국에 고성능 안테나를 배치하고 교환시설도 3000 가입자 용량으로 올렸다. 제도적으로도 전기통신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기봅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정해 현실에 맞게 재편했다.
일사천리로 세부계획을 완성한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실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회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결과 카폰 보급에 앞서 1984년 2월 10일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 전담회사 설립계획안’을 도출했다. 이 계획안의 전담회사가 바로 3월 29일 출범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즉, 현재 SK텔레콤의 전신이다. 이우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발기인으로 8명 전원 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됏으며, 초대 사장으로는 유영린 전 전기통신공사 원주지사장이 선임됐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문을 열자마자 4월 2일 계획된 수도권 대상 3000대의 카폰 청약 접수를 받았다. 문제는 그 인기가 실로 대단했다는 것. 하루 청약 문의는 30~40건, 실제 청약접수는 20~30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카폰설치를 위한 차량튜닝 소요시간 등 일반유선전화도 전국에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초라는 시대상을 감안했을 때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 분량이었다. 게다가 3개월만에 청약이 마감됐음에도 차수 예약 전화까지 감당해야 했다. 말 그대로 피 땀 눈물의 현장이었다.

한국이동통신 새출발
1986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국 도서지역까지 수동식 전화를 자동식으로 개선한 전국자동통화체제를 이룩했다. 1가구 1전화 시대가 도래한 셈. 일반유선전화의 대중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진화단계에 올라섰음을 의미했다.
통신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내부적 열망과 함께 외부적인 부침도 상당했다. 1986년 창설된 우루과이 라운드(RU)는 시장 개방 압력이 보다 거세지는 계기가 됐다. 협상 범위에 통신서비스 분야도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상했다. 내부적 열망과 외부적 압박은 곧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해답으로 귀결됐다. 이 답은 국영 독점체제의 국내 통신시장이 민간 경쟁제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바람으로 전이됐다.
전국 유선전화망을 보유한 한국전기통사,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 ‘한국데이터통신’, 자동차다이얼전화와 무선호출 등 무선망사업을 전개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 등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수평적으로 흔들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1988년 5월 ‘공중전기사업자업무영역 조정지침’을 전달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데이터 사업을, 한국데이터통신은 전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 유선망에서의 경쟁구도가 발생한 것.
다만, 무선쪽은 달랐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기도 했거니와 삐삐나 카폰을 달아주는 위탁업체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려웠다. 하지만 무선분야는 잠재력이 큰 분야였다. 체신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이동통신 자립 육성 방안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육성방향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한국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품는 방법, 다른 쪽은 독립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앞서 동일사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후자는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다만, 당시 시류가 독점경영을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기술진보가 목적이었기에 전자보다는 후자에 무게가 실렸다.
체신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고를 기반으로 1988년 1월 14일 이동통신 전문화 육성 기본방침을 재하달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비로소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가 가능해졌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1988년 5월 13일 사명을 ‘한국이동통신’으로 변경했다. 총 임직원은 120명에서 199명으로 늘어났다. 자본금은 19억원으로 증자됐다. 통신공사 현물 출자 인수는 2차에 걸쳐 이뤄졌다. 인수금액은 총 63억9281만원이다. 이후 6월 1일 ‘한국전기통사와 한국이동통신 간 시설 이관과 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독립의 기반을 모두 마무리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국민 절반 이상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반대”…안보·주권 우려가 가장 커
2025-04-22 19:54:05 -
"이젠 기업이 선택받는 시대…초핵심 인재 확보가 성패 가른다"(종합)
2025-04-22 17:51:03 - 2025-04-22 17:39:15
-
[DD퇴근길] "11일만에 매출 100억"…넷마블, 'RF온라인'으로 재도약 시동
2025-04-22 17:09:02 -
LG전자,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전장공급 역량 인정"
2025-04-2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