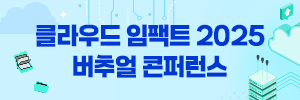韓 태양광 웨이퍼 업체 맥 끊기나…웅진에너지, 매각 가능성↑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국내 태양광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덕분에 태양전지 제조사 매출이 늘었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태양광용 웨이퍼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웅진에너지가 유일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1345메가와트(MW)다. 전년동기대비 49.9% 늘었다. 국내에서 보급되는 재생에너지(총 1596MW) 가운데 84.3%를 차지한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태양전지)·모듈(태양전지 모아놓은 패널) ▲발전소 등 크게 4분야로 나뉜다. 주요 성분인 규소(Si)인 폴리실리콘은 웨이퍼의 원재료다. 규소 순도에 따라 태양광용(99.9999999%)과 반도체용(99.999999999%)으로 나뉜다.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통형 덩어리인 잉곳을 만든다. 이를 얇게 자르면 웨이퍼가 된다. 웨이퍼로 셀과 모듈을 만들고, 이는 발전소에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OCI,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 등이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 문제는 잉곳·웨이퍼 분야다. 한국 기업 중 웅진에너지만 태양광용 웨이퍼를 공급한다. 과거 SK실트론, SKC솔믹스, 한솔테크닉스, 넥솔론 등도 태양광용 잉곳·웨이퍼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 물량 공세로 모두 철수했다.
웅진에너지 역시 위기다. 사업 부진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이했다. 웅진그룹은 경영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업체가 인수한다는 소문도 전해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웅진에너지 매각 이슈는 국내 태양전지 제조사들에게 부정적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LG전자, 신성이엔지 등은 이미 태양광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웅진에너지마저 없으면 웨이퍼는 100% 수입해야 한다.
현재 태양광용 웨이퍼 시장은 중국 GCL, 롱지, 진코솔라, 중한 등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사라질 경우 일본 수출규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업체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용 웨이퍼를 공급하는 국내 회사 대다수가 사라진 상태다.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면서 “향후 웨이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 -
KT클라우드, 업스테이지·리벨리온 등과 ‘AI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2025-04-18 17:42:17 -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AI 네이티브, 데이터의 숨은 가치부터 찾아야”
2025-04-18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