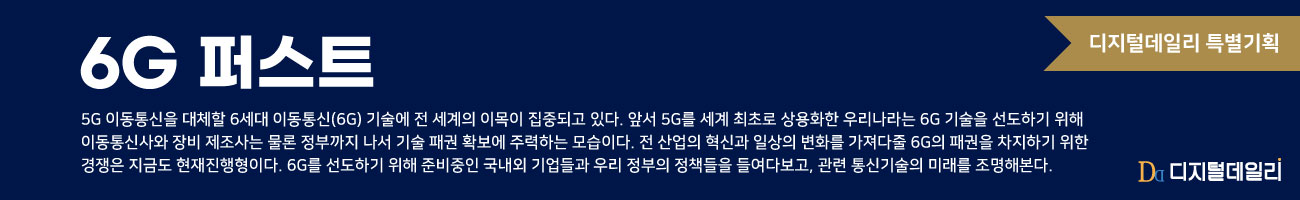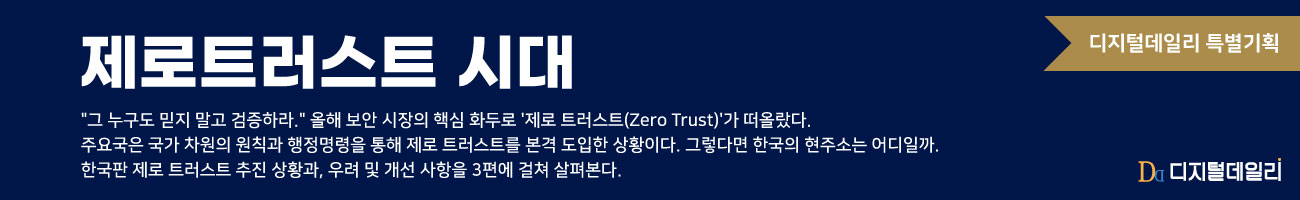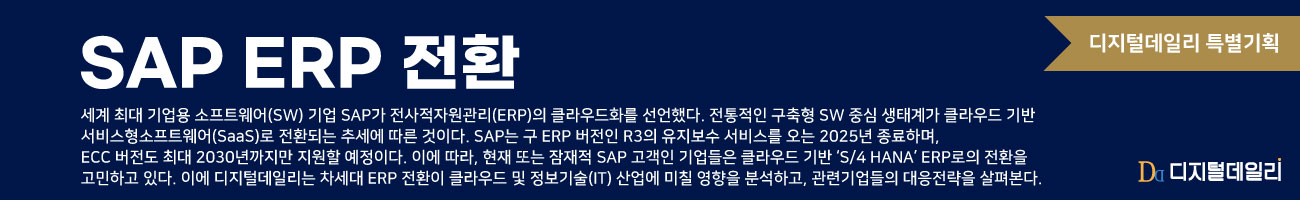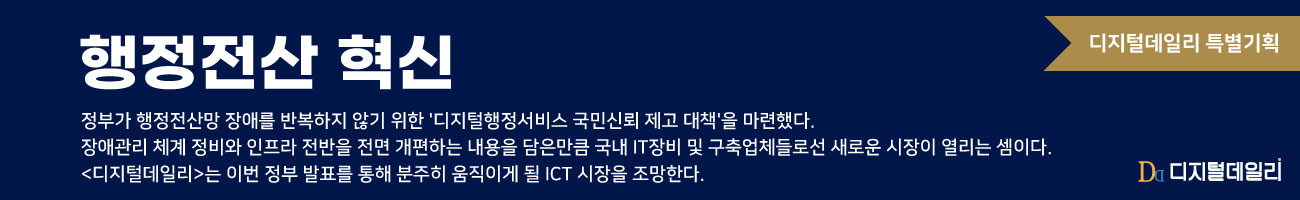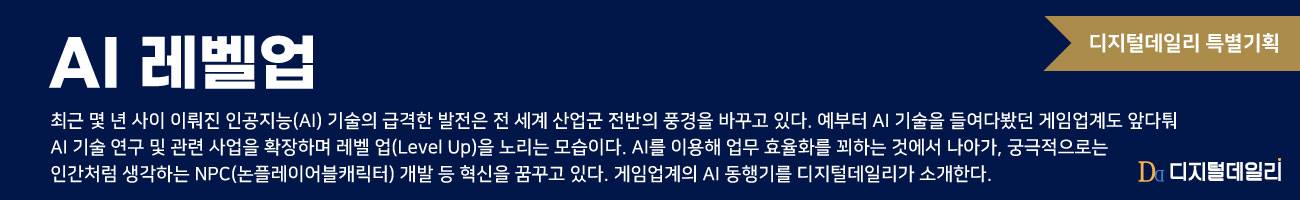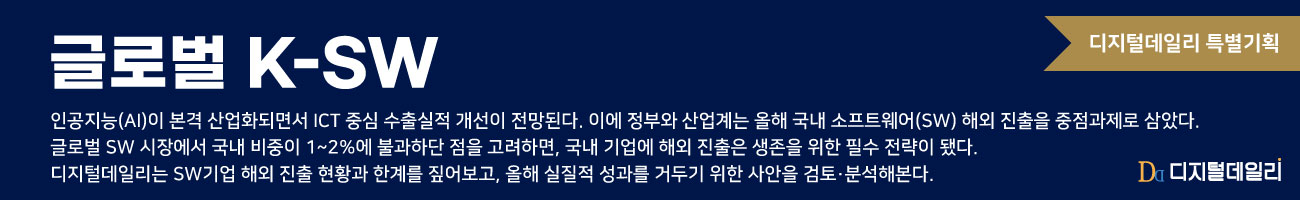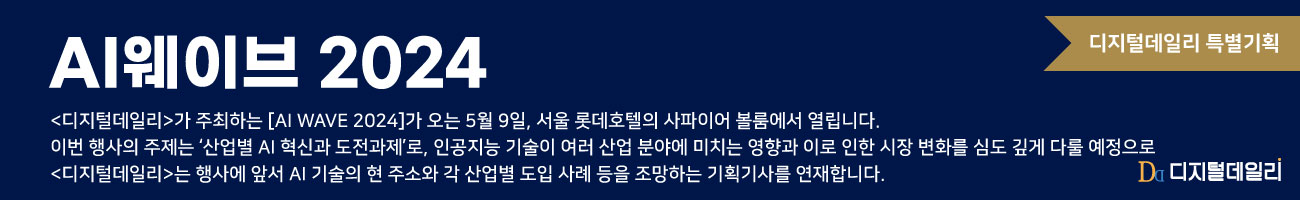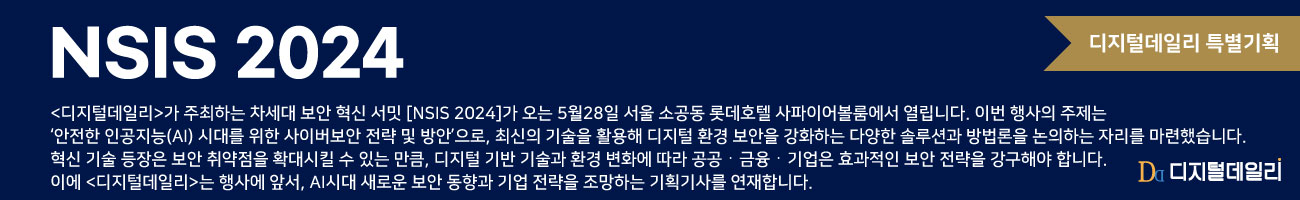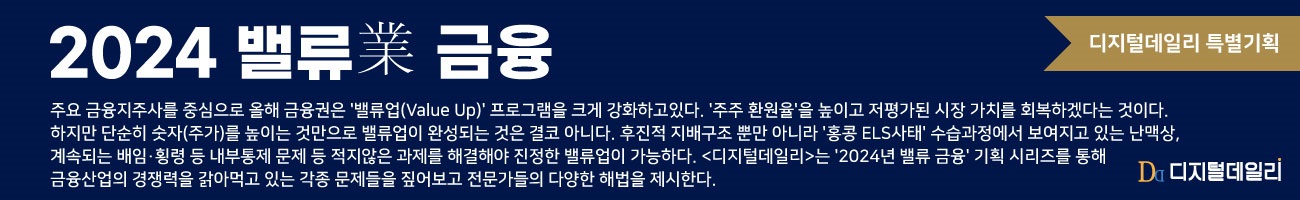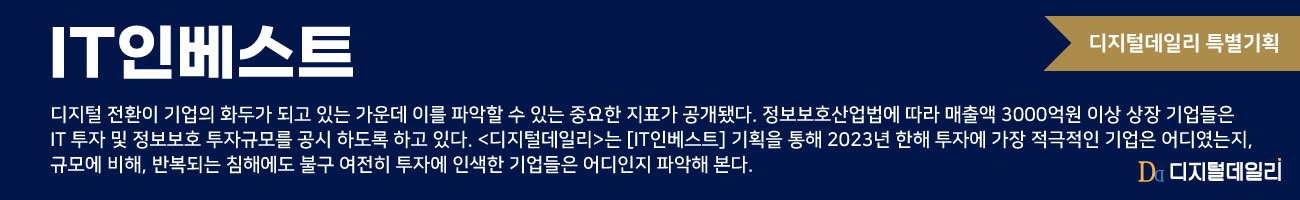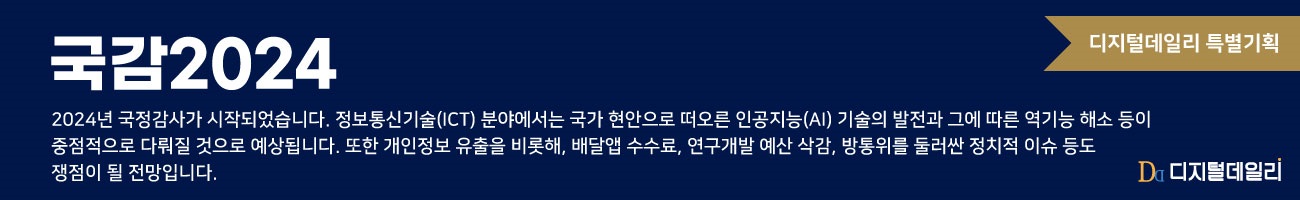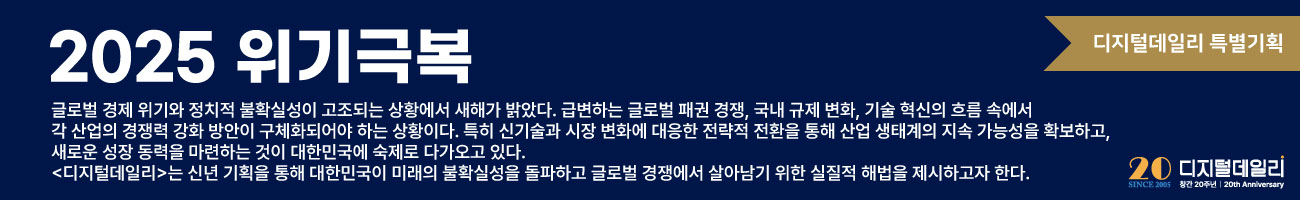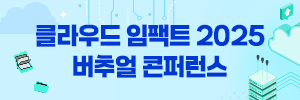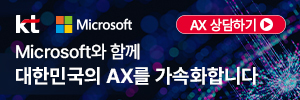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료방송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상대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면,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TV(IPTV)는 셋톱박스, 케이블TV는 지역 특화 고급망을 활용하여 OTT와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FAST) 등 시장 내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이야기됐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8일 전북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진행된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OTT발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며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의식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방송사업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10년 만이다.
방송사업자 중 IPTV만이 유일한 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도 성장세는 크게 둔화됐다. 2023년 매출은 5조72억원으로, 2022년 대비 2.3%(112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OTT는 나홀로 성장 중이다. 2024년 주요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의 매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OTT 이용률도 2022년 72.0%에서 2023년 66.0%로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같은기간 유료 가입자 비중도 55.9%에서 57.0%로 늘었다.
매출 증가세가 위축된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는 늘면서 유료방송의 재정적 압박은 커졌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서 방송 채널의 전송권과 그 대가가 결정되는 방송채널거래시장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조4940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상파PP의 재송신료 매출액 증가 영향이 컸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료(CPS) 매출액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료방송 시장의 정체 속 김 교수는 셋톱박스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셋톱박스를 통해 전체 가입자 기반의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고, 가구별 시청 패턴을 파악 가능하다. 또 리모컨 조작 등 상세 행동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한계도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로부터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데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비용이 요구됐다. 시청 행태 데이터와 관련해 오차범위도 컸다. 셋톱박스 작동 시간과 실제 시청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가구 단위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가구 내 개인 식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세계 최대 TV 시장인 미국에서 약 4000시간 분량의 K-콘텐츠를 출시했다. [ⓒ삼성전자[]](https://www.ddaily.co.kr/photos/2024/10/04/2024100409290891878_l.jpg)
김 교수는 FAST와의 통합 광고 에코시스템 구축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FAST는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앞자리를 딴 단어다. 즉, 광고를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광고형 VOD(AVOD)’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AVOD 콘텐츠를 하나의 TV채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 광고 에코시스템은 이러한 FAST의 사업모델에 유료방송 셋톱박스 인프라를 융합하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유료방송은 셋톱박스와 함께 FAST의 자동콘텐츠인식(ACR)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시청 행태 파악이 가능하고, FAST 역시 기존 유료방송의 인프라와 구독자 기반을 활용한 광고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통합 데이터 기반의 수익화 전략도 제안됐다. 퍼스트파티 데이터 기반의 공동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시청 데이터 기반 오디언스 세그먼트 광고를 상품화하고, 광고 시청량에 따라 구독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구독료-광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시청 시간 및 광고 노출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자에 보상해주는 콘텐츠 수익 공유 구조도 제시됐다.
특히, 권역사업자인 케이블TV와는 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얻은 데이터(고객의 시청/구매이력 기반 상품 구성 및 방송편성 데이터)를 통한 상품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역 생활 정보 프로그램 소재와 커머스 상품을 구성하고, 스마트 몰을 통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지역 특화 고급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과 광고주, 콘텐츠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봤다.
통합모델 기준 데이터 유형별 수익 배분 모델 예시도 제시됐다. 수익 배분 비율은 ▲셋톱박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IPTV·케이블TV 사업자는 30~40% ▲OTT 시청 로그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은 25~35%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송사·제작사는 15~25% ▲광고 캠페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광고주·대행사에는 15~25% ▲분석결과/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은 20~30% ▲기술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공급자는 15~20%로 제시됐다.
시장에서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강조됐다. 법제 정비를 통해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명확히하고, 데이터 가치 평가 및 거래 관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이행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고도 그는 말했다. 초기 단계(1~2년차) 정부 주도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해주면, 성숙단계(5년)부터는 민간이 주도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며 민관 협력형 데이터 생태계를 주도해나가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의 복잡성 속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간 합리적 가치 분배 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 - 2025-04-19 12:36:35
-
[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