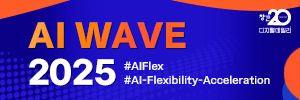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디지털 오디세이 / 병원, ‘스마트’해지다 ⑦] 환자 맞춤형 혁신이 쉽지 않은 이유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으로 팬데믹 이후 의료계 혁신을 꾀하며 스마트병원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나온 의료혁신기기를 단순히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스마트병원 관련해 일부 상급병원과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 기업간의 컨소시엄별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간의 교류 등은 아직은 요원하다. 각 병원별 특화해 만든 기술을 타 병원으로 확산하는 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명과 연관된 일에 사례 누적이 적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도움된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따르면, 파워이송카 등 환자 이송에 쓰는 이른바 스마트 병상은 카트와 환자 무게에 다른 장비 무게까지 더해져 환자 이송원의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해 실험적 단계에 머물렀다. 이동통로에 경사가 있거나 건물 사용 중 일부 리모델링 등 변수 발생시 이송 설계에 즉각 반영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안전문제 발생시 책임 범위 등도 모호하다.
AI 연계 동선 확인은 개인정보 사용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체 환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원격 진료 또한 어떤 수준의 개입이 허용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 설정과 보안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면 비용이 높아지는 어려움이 생긴다. 정부가 뉴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주고는 있지만 모든 병원 대상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병상으로 표현되는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Smart Beside Station)은 환자 맞춤형 정보를 구축해 유용하지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연동 등을 전 병실로 확장하기엔 비용적 무리가 있다. 병원 물류 관리 등도 현재 병원에서 저장되지 않는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활용해 향후 과정 혁신 등에 도움될 수 있으나 비용이 높고 병원에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어려워 신속한 도입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외 관계 인프라망서 개발업체의 한계도 지적된다. 5G 기술 도입의 경우 국내 3개 통신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의료기관 전용으로 어떻게 배분, 사용할지에 대한 사례 누적이 된 바 없어 체계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RPA의 경우 의료기관 중심으로 개발된 국내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원의 모든 데이터를 다뤄야 해 관련 업체도 적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 내 시스템 도입 등은 사실 병원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체 입장에서 완전히 모든 걸 알고 시스템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적으로 병원의 요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병원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것을 개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공정위, LTV 담합 의혹 관련 4대 은행 제재 착수…소송전 번지나
2025-05-11 06:48:19 -
대선판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스테이블코인'… 이준석 직격에 민주당 '발끈'
2025-05-11 06:47:44 -
[현장]“어르신, 온라인 예약 하셨어요?”...SKT 유심교체 방문해보니
2025-05-10 07:07:00 -
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2025-05-09 19:09:38 -
주니퍼네트웍스, 가트너 '데이터센터 스위칭 부문' 리더 선정
2025-05-09 17: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