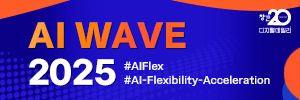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취재수첩]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단통법
- 가
- 가

단통법은 처음부터 난관이었다. 장려금을 포함한 지원금 재원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자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엔 규제당국 감시를 피해 새벽에 아이폰6을 싸게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나타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후에도 통신사 과열경쟁으로 불법보조금 투입 정황이 포착돼 방통위로부터 여러 번 제재 조치를 받았다. 물론 지금은 통신3사가 이전처럼 과열경쟁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출혈경쟁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이어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마케팅비용을 아낀 후 통신3사 실적은 개선됐다.
그럼에도 스팟성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며 통신비 인상을 부추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고객에게 요구한 신분증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유통망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 여론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막아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원성이다.
7년이 지났다. 정부는 단통법 손질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속속 발의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까지 거론했다. 투명한 유통질서, 이용자 복리 증진 입법목적 달성에 모두 미달했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실패 지적에 ‘25% 요금할인’을 성과로 지목하고 있다. 단통법이 없었다면 25% 요금할인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하고 있을까? 5G 상용화 후 단말 출고가는 100만원대를 웃돌기 시작했고, 5G 통신비 부담도 늘었다.
결국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늘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동통신 시장을 이루는 통신사-유통망-소비자 모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금보다 5만원 이상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단통법 초기 입법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것과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통신사와 유통망은 정부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아닌 유통망 몫이다. 이에 코로나19 시국에 중소 유통망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도 모든 유통점에서 동일하게 5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통신사는 한정된 마케팅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줄이거나 또는 대형 유통망에만 장려금을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만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건 아니다. 건전한 유통 생태계와 이용자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때다. 개정안을 하나씩 마련할 때마다 단통법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보았듯, ‘정부의 손’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오늘부터 최대 80% 할인"…무신사, '뷰티 페스타' 돌입
2025-05-12 09:12:32 -
디지털자산 범죄 타킷으로 떠오른 5060세대… 두나무 "금감원과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2025-05-12 09:05:22 -
[주간 클라우드 동향/5월②] 중국發 오픈소스 추론 AI 공세 본격화
2025-05-12 07:58:20 -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알고리즘 문제점 노출… 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시 엄정 대응" 경고
2025-05-11 20:20:12 -
카드론·캐피탈·대부업체 비대면 대출도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2025-05-11 1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