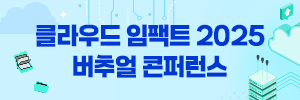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2018 첨단산업 전망①] 반도체, 호황과 불안의 교차점…기술만이 살길
- 가
-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이제껏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개척자(퍼스트무버)가 아닌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우)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는 각 산업의 수위에 오른 만큼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많다. 첨단산업에서 확보해야 할 새로운 경쟁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지난해 D램·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도체 ‘슈퍼’호황은 한 마디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4차 산업혁명 선제투자의 성격과 함께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 전형적인 장치 산업의 특성, 치킨게임 이후 경쟁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반도체 수요의 증가는 후방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같은 협단체뿐 아니라 IC인사이츠, IHS마킷과 같은 시장조사업체가 여러 차례 성장률을 조정했을 정도로 장밋빛 그 자체가 됐다. 수치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장비, 재료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걸쳐 낙수효과가 상당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호황)’ 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호황지속→불황)’이 생길지가 업계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과거와 달리 D램은 치킨게임이 끝났고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업체가 분명하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공급량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도시바, 마이크론, 인텔, 웨스턴디지털(WD, 샌디스크)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도 호황의 바통은 이어받겠지만 기세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성장세가 둔화되느냐에 달렸다.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처는 여전히 견조하겠지만 내후년까지 획기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클라우드에 무조건 의존할 수 없고 엣지 컴퓨팅(종단 데이터 처리)이 대세가 되리라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예컨대 스마트폰 D램 용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PC가 그랬던 것처럼 일정 수준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성장세 둔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 찾아야=시장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을 살피면, 미세공정 한계로 인해 연구개발(R&D)은 물론 설비투자(CAPEX)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몇 나노로 칩을 만들 수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제까지 반도체 시장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들인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았던 덕분이다.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마이크로프로세서, D램, 낸드플래시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제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한다. 삼성전자가 스핀주입자화반전메모리(STT-M램), 인텔이 상변화메모리(P램)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이머징 메모리는 새로운 재료, 공정, 설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재료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가야할 길이 멀다. SEMI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은 지난해 3.1%(253억3800만달러) 성장을 나타내 2014년(242억5000만달러) 시장규모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생태계의 복잡성, 기술유출 우려로 폐쇄적인 정보망, 그리고 높은 진입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재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양산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재료와 특허는 아직까지 갈길이 멀다”며 “공급과잉이라는 변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결국 기술뿐”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 -
KT클라우드, 업스테이지·리벨리온 등과 ‘AI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2025-04-18 17:42:17 -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AI 네이티브, 데이터의 숨은 가치부터 찾아야”
2025-04-18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