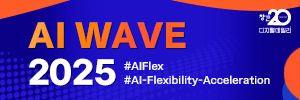정통부→방통위→미래부…ICT 공무원 5년마다 자리이동 곤욕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철새가 때 되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 하듯 공무원들의 자리이동 시기가 도래했다.
5년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부처 조직들이 이동할 것인지이다.
5년전 정보통신부 해체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던 ICT 분야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또 다시 자리 이동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자리 이동을 놓고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곳은 정통부 업무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방통위다.
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체 조직이 확대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미래부가 ICT 정책까지 담당하기로 결정된데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싱숭생숭하다. 한마디로 5년전 정통부 해체직전의 모습이다.
5년전에는 방송위원회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곤욕을 치뤘고, 조직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다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업무의 분리로 도로 정통부, 방송위 구도가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현재 맡고 있는 직제를 중심으로 인력 이동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여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리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다.
일단 정통부 및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미래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에 잔류할 경우 고위직 자리도 한정돼 있는데다 업무능력을 평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독임제 부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장이 정책을 결정한다.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눈에 띄기도 쉽지만 방통위의 경우 사실 대부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는다. 책임과 권한도 적어 정통 공무원 조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성과를 내려면 독임제 부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 업무 정도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본부 인원 501명 중 15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이 옛 방송위 수준만 유지돼도 방통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도 방통위 조직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 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의 승진이 한계가 있는데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는 만큼, 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미래부가 향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방통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들도 존재한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계속해서 과천 청사에 잔류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맡은 보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래부 이동, 방통위 잔류 여부를 놓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의 직제대로 갈 사람 남을 사람을 결정하겠지만 방통위에 잔류하거나 미래부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의 경우 조율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간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이 마련된 만큼, 양 조직간 교류를 통해 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5년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부처 조직들이 이동할 것인지이다.
5년전 정보통신부 해체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던 ICT 분야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또 다시 자리 이동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자리 이동을 놓고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곳은 정통부 업무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방통위다.
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체 조직이 확대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미래부가 ICT 정책까지 담당하기로 결정된데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싱숭생숭하다. 한마디로 5년전 정통부 해체직전의 모습이다.
5년전에는 방송위원회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곤욕을 치뤘고, 조직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다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업무의 분리로 도로 정통부, 방송위 구도가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현재 맡고 있는 직제를 중심으로 인력 이동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여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리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다.
일단 정통부 및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미래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에 잔류할 경우 고위직 자리도 한정돼 있는데다 업무능력을 평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독임제 부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장이 정책을 결정한다.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눈에 띄기도 쉽지만 방통위의 경우 사실 대부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는다. 책임과 권한도 적어 정통 공무원 조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성과를 내려면 독임제 부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 업무 정도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본부 인원 501명 중 15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이 옛 방송위 수준만 유지돼도 방통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도 방통위 조직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 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의 승진이 한계가 있는데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는 만큼, 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미래부가 향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방통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들도 존재한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계속해서 과천 청사에 잔류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맡은 보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래부 이동, 방통위 잔류 여부를 놓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의 직제대로 갈 사람 남을 사람을 결정하겠지만 방통위에 잔류하거나 미래부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의 경우 조율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간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이 마련된 만큼, 양 조직간 교류를 통해 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현장]“어르신, 온라인 예약 하셨어요?”...SKT 유심교체 방문해보니
2025-05-10 07:07:00 -
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2025-05-09 19:09:38 -
주니퍼네트웍스, 가트너 '데이터센터 스위칭 부문' 리더 선정
2025-05-09 17:41:02 -
[DD퇴근길] 김영섭號 KT, 통신 다음은 AI…"MS 협력 성과 가시화"
2025-05-09 17:25:15 -
연 6.0% 우대금리 혜택… 새마을금고 어린이 맞춤형 'MG꿈나무적금' 5만5천계좌 판매
2025-05-09 17: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