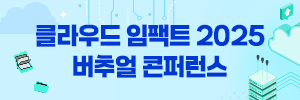6G 주파수 후보대역 곧 선정…KT, 관련기술 확보 나선다
- 가
- 가
![김성관 KT 융합기술원 6G 네트워크기술 프로젝트팀장. [Ⓒ KT]](https://www.ddaily.co.kr/photos/2023/09/04/2023090411520468531_l.jpg)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올해 말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6G(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후보대역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고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KT가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반 확보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공급자연합회(GSA)는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APG23-6) 회의에서 7㎓(기가헤르츠)와 10㎓, 12㎓, 13㎓ 등을 6G 주파수 후보대역으로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 사업자들로 구성된 GSA가 제안한 만큼 최종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6G에 대한 표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6G의 경우 서비스 시나리오나 스펙 등 비전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협력기구인 3GPP는 6G 표준을 정의한 릴리즈21를 오는 2028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이 제정된 뒤 상용화되기까지 대략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화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전망된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사도 6G 시대 채비에 나섰다. 노키아와 삼성전자, 일본 NTT도코모 등도 앞서 ‘6G 백서’를 발간하며 6G비전을 제시하 바 있다. 삼성전자가 2020년 발간한 ‘6G 백서’에 따르면 이론상 6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5G보다 50배 빠른 1테라비피에스(Tbps·1초에 1조 비트를 전송하는 속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의 해소다. 통상 고주파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기지국을 훨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고주파 대역을 활용할 6G의 경우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함께 5G 28㎓와 같은 고주파 대역에서 기술적 한계로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며 주파수를 회수 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KT는 향후 6G 본격화에 대비해 고주파 대역와 관련 음영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IS(재구성가능한 지능형 표면·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가 대표적이다.
RIS는 안테나 표면의 전자기적 반사 특성을 이용해 장애물 너머 수신자한테 전파가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테면 전파가 통과하기 어려운 코팅된 유리창에 투명한 필름형태의 안테나를 달아 전파의 방향을 꺾어 건물 내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G 28㎓와 같은 고주파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통과하지 못해 커버리지 역시 3.5㎓ 대역의 10~15%에 불과한 가운데 RIS는 전파의 방향을 꺾어 이런 음영지역을 해소한다.
앞서 KT는 인빌딩 구축 작업을 통해 실내 커버리지 구축에 힘써왔다. 고주파 대역의 경우 실내 통신망 구축 설계가 더 까다로운데, 빌딩마다 실내 인빌딩 중계기가 없으면 실외 커버리지만으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중계기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제조에 반도체칩이 많이 사용돼 원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상용화 시점에 RIS는 중계기와 비교해 제조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KT의 경우 타 업체와 협력해 3.5㎓와 8㎓, 12㎓, 15㎓, 28㎓ 등 총 5개의 대역에서 RIS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김성관 KT 융합기술원 6G 네트워크기술 프로젝트팀장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파장의 길이가 다르기에 RIS의 구조도 다르게 설계할 수 밖에 없다”라며 “RIS를 설치했을 때 음영지역 개선율 수치는 20dB(데시벨) 정도 개선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오픈랜도 6G시대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오픈랜은 무선접속망(RAN)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통신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API) 등 소프트웨어 요소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규정,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기지국은 무선신호처리부(RU·Radio Unit)와 분산장치(DU·Distributed Unit), 중앙장치(CU·entralized Unit) 등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이 장비들이 모두 동일 회사 제품이어야만 상호 신호연결이 가능했다.
예컨대 화웨이의 RU와 DU는 서로 호환되지만, 화웨이의 RU와 삼성전자의 DU 간 상호 교신은 불가했다. 통신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API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는 운영의 용이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1~2개사의 통신장비 만을 이용, 특정 통신장비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이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픈랜은 이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통신사의 입장에선, API의 개방화로 하나의 장비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제조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선택해 무선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중소 장비 제조사는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팀장은 "각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오픈랜이 상용화되면) 대체적으로 운영비와 투자비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CAPEX를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 -
[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 -
KT클라우드, 업스테이지·리벨리온 등과 ‘AI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2025-04-18 17:42:17 -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AI 네이티브, 데이터의 숨은 가치부터 찾아야”
2025-04-18 17:42:00 -
작년 해킹 80%는 '북한발'…"방산의 'ㅂ'만 들어가면 다 턴다"
2025-04-18 17: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