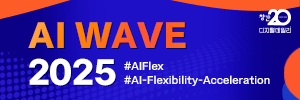1세대 퇴장...판 바뀐 e커머스 ‘가격→배송’ 경쟁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인터파크가 최근 매물로 나오며 실상 1세대 e커머스 퇴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e커머스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 이베이를 인수한 신세계 등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들은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배송 속도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1일 신세계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에 따르면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협력업체 빠른배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를 발표하며 4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투자한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SSG닷컴은 자체 상품 중심으로 당일배송 및 새벽배송을 운영 중이다. 동시에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난 6월 오픈마켓을 시작해 판매자 모집에 한창이다.
온라인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면서 SSG닷컴 오픈마켓 판매자들도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다. 시기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e커머스 업계 특성상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송서비스 확장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앞세워 '빠른 배송' 시대를 열었고 이젠 중소상공인들도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e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판매자들을 위한 3자 물류(3PL)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판매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거나 새로운 계약형태를 맺어야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업계 1위인 네이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함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중심으로 전국 빠른 배송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기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심으로 운영해온 곤지암·군포·용인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추가로 20만평 규모 이상의 풀필먼트 센터를 설립한다.
현재는 브랜드 기업이 입점한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만 익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중소상공인(SME) 중심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생필품, 신선식품 등 빠른 배송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많은 상품군은 당일배송 및 새벽배송도 가능할 수 있게 인프라를 확충한다.
쿠팡도 직매입 중심이긴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의 중개 플랫폼 역할도 한다. 이들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트배송’을 도입했다. 판매자들은 제품 가격이나 할인율, 프로모션 진행까지 자체 전략을 세우면서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과거 e커머스 시장에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최저가 경쟁’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이젠 10원 혹은 100원 단위 가격차를 비교하며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은 크게 줄었다. 오히려 가치소비를 중시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정확한 날에 상품을 배송받길 원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물류센터 운영업체들이 인공지능(AI) 수요예측이나 친환경 패키징을 도입하는 이유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만 우선시하기보다 이왕이면 고정 플랫폼에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빠른 배송도 단순 속도보단 주문하면 도착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빠른 배송을 위해선 곳곳에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가 얼마나 촘촘하게 위치해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대규모 물류센터단지를 조성하는 반면 네이버는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신세계는 전국에 위치한 오프라인 점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물류 인프라 투자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빠른 배송 경쟁은 누가 더 과감히 투자하는지 자본력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베이코리아나 인터파크 등 1세대 e커머스가 최근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이와 연관된다. 처음 시장에 진입해 ‘최저가 보장제’ 등을 도입하며 고객들을 모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화 지점이 흐려졌다. 후발주자들이 기존 서비스들을 포함해 식품·빠른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들 지속 선보였기 때문이다. 1세대 e커머스 업체들이 웹 기반으로 만들어진 점과 달리 후발업체는 처음부터 모바일 기반으로 만들어져 사용자 환경(UI)이나 경험(UX)이 우위에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 입장에선 다방면으로 투자가 필요했지만 투자금 부족 등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며 “뚜렷한 특색이 없어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요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크립토닷컴, 케이에스넷과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파트너십 체결
2025-05-13 17:30:07 -
"하필 대선 기간때"… MG손보 노조, ‘일부 영업 정지’·‘폐쇄형 가교 보험사’ 금융위 방안에 강력 반발
2025-05-13 17:17:31 -
'스테이블코인' 대선 이슈 선점나선 민주당… 윤여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
2025-05-13 16:50:19 - 2025-05-13 16:48:34
-
'네트워크 보안 강자' 엑스게이트, 양자로 퀀텀점프…"보안 고도화 집중"
2025-05-13 16: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