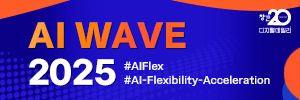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취재수첩] 삼성전자와 애플TV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화학으로 자리를 옮긴 권영수 전 LG디스플레이 대표는 지난해 한 기자회견에서 “액정표시장치(LCD) 업계가 어려운 건 거시 경제 불안 탓이지만,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TV 제조업체 책임도 크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매년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채용한 평판TV가 등장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비싸진 가격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화학으로 자리를 옮긴 권영수 전 LG디스플레이 대표는 지난해 한 기자회견에서 “액정표시장치(LCD) 업계가 어려운 건 거시 경제 불안 탓이지만,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TV 제조업체 책임도 크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매년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채용한 평판TV가 등장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비싸진 가격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평판TV 시장 규모는 2억4770만대로 전년 대비 0.3% 축소됐다. 평판TV의 수요 감소는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LCD TV는 출하량이 7% 늘었지만 꾸준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것을 떠올리면 ‘정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듯 싶다. 일본의 간판 전자업체인 소니, 파나소닉, 샤프는 TV 판매가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되자 조직의 수장을 교체하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꾀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세계 1, 2위 TV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본 업체와는 달리 이익을 내고 있고 있긴 하나 신규 수요를 창출할 만큼의 혁신 제품은 내놓질 못하고 있다. LG전자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TV에 탑재되는 음성·제스처 인식 기능이 ‘혁신을 위한 혁신’이라고 깎아내렸으며 삼성전자도 LG전자의 구형 3D TV가 지상파 3D 방송을 수신하지 못한다며 이제껏 외쳐댔던 ‘3D’는 단지 마케팅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주 발표한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조8000억원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요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신이 났다. 전사 이익의 70% 가까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면 박수를 쳤었다. 애플 아이폰 때문에 잠깐 고생을 했지만 ‘신시장’을 창출해준 애플 덕을 보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례를 보면 애플의 TV 출시를 부정적으로 볼 것 만도 아니라는 뼈 있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디베이트연구협회가 일본의 경영인들에게 삼성전자를 배워야한다며 지은 ‘세계 최강기업 삼성이 두렵다’라는 책에서조차 “모방과 학습으로 이뤄지는 벤치마킹은 삼성의 문화이며 DNA”라고 적혀 있다. 이는 비단 삼성전자만을 가리키는 글귀는 아닐 것이다. 패스트 팔로워였던 우리 기업들은 안갯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해외서도 응급의료 상담 가능”…LGU+, 소방청과 '안전·연결' 캠페인 진행
2025-05-11 12:00:00 -
[인터뷰] 의사 가운 벗고 AI 입다…실리콘밸리 홀린 ‘피클’
2025-05-11 11:55:43 -
[OTT레이더] 강하늘X고민시의 쓰리스타 로맨스, 넷플릭스 '당신의 맛'
2025-05-11 11:54:28 -
SKT 유심 교체 고객 143만명…6월 말까지 1077만장 유심 확보
2025-05-11 11:54:16 -
농협금융, "녹색금융 전략 강화"…ESG추진협의회 개최
2025-05-11 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