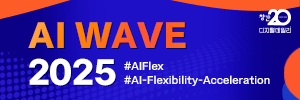공중전화 10년만에 절반으로 뚝…적자는 여전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00년대 초반 15만대에 육박하던 공중전화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서민의 통신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동통신의 등장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일 KT,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중전화 시설대수는 8만380대로 집계됐다. 자급 공중전화는 3만415대다.
십수년전인 1998년만해도 공중전화 사업은 연 매출 7800억원을 기록할 만큼 KT에게 효자 상품이었다. 무선호출기, 소위 삐삐가 통신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을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는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이동전화 보급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중전화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2년 무인 공중전화는 14만3000대로 KT는 이를 통해 2601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비용으로 3402억원을 지출하면서 8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중전화 시설 유지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KT링커스는 주력사업인 공중전화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커피 유통 등 물류사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T링커스는 지난해 공중전화 사업을 통해 60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비용이 훨씬 많았다. 공중전화 적자는 KT 뿐 아니라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골칫덩이다.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다른 통신사들도 손실 보전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손실 분담금을 분담하는 다른 통신사들은 전국의 공중전화 수를 축소해 손실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최근 결정된 2010년도 공중전화의 손실 보전금은 226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나마 방통위가 공중전화대수를 줄이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3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적자만 나고 향후 비전도 없으니 KT 입장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맘대로 포기하거나 운영대수를 줄일 수도 없다. 아직까지는 공중전화 이외에 이동통신 및 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 3분에 70원(시내전화 기준)인 이용요금을 1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가 됐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인데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방통위는 공중전화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보편적 역무로 구분한 만큼,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자가 난다고 공중전화 대수를 마냥 줄일 수는 없다"며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10일 KT,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중전화 시설대수는 8만380대로 집계됐다. 자급 공중전화는 3만415대다.
십수년전인 1998년만해도 공중전화 사업은 연 매출 7800억원을 기록할 만큼 KT에게 효자 상품이었다. 무선호출기, 소위 삐삐가 통신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을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는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이동전화 보급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중전화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2년 무인 공중전화는 14만3000대로 KT는 이를 통해 2601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비용으로 3402억원을 지출하면서 8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중전화 시설 유지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KT링커스는 주력사업인 공중전화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커피 유통 등 물류사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T링커스는 지난해 공중전화 사업을 통해 60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비용이 훨씬 많았다. 공중전화 적자는 KT 뿐 아니라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골칫덩이다.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다른 통신사들도 손실 보전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손실 분담금을 분담하는 다른 통신사들은 전국의 공중전화 수를 축소해 손실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최근 결정된 2010년도 공중전화의 손실 보전금은 226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나마 방통위가 공중전화대수를 줄이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3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적자만 나고 향후 비전도 없으니 KT 입장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맘대로 포기하거나 운영대수를 줄일 수도 없다. 아직까지는 공중전화 이외에 이동통신 및 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 3분에 70원(시내전화 기준)인 이용요금을 1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가 됐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인데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방통위는 공중전화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보편적 역무로 구분한 만큼,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자가 난다고 공중전화 대수를 마냥 줄일 수는 없다"며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2025-05-14 11:57:54
-
두 번의 SKT 사태 없다…'개인정보 정책포럼' 21일 개최
2025-05-14 11:49:23 -
HPE, KISTI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자 선정
2025-05-14 11:49:02 -
SKT,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다음주부터 시작…"유통망 소통체계 강화"
2025-05-14 11:11:42 -
신한라이프, 한신평으로부터 18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 획득
2025-05-14 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