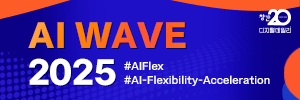[취재수첩] 기업 내 클라우드 조직 구성이 어려운 이유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기업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클라우드’ 인프라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위해 클라우드에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사이클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클라우드 관련 개발자 수급도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면서 개발자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형국이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기업에선 클라우드를 전담할 조직 구성도 필요해졌다.
다만 아직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개발을 담당하던 IT부서에선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하려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체 인력을 클라우드 전문가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개발자들은 개발만 하려하지만 클라우드는 인프라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클라우드에서 개발자들은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조직을 꾸리기 어려운 이유로도 꼽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은 역할과 책임(RNR)이 분명한데 클라우드는 사실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기획 등 새로운 포지셔닝이 생기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클라우드가 직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기업에 새로 생기고 있는 일자리다.
과거 IT부서가 기업 내부 대표적인 비용 소비 부서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비즈니스 인에이블러(Business enabler)라는 과제를 스스로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다르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구축형) 사업은 사용자 측면에서 관점이 다르다. 온프레미스가 예산 수립과 비용 지출을 통해 결과를 내고 이를 리포팅하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면 클라우드는 이른바 ‘셀프서비스’ 구조다.
필요한 것을 바로 가져다 쓰고 결과도 바로 내는 것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ROI(투자대비수익)도 빨리 나온다. IT부서가 비즈니스 인에이블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느냐도 여기에 고려할 점이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크립토닷컴, 케이에스넷과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파트너십 체결
2025-05-13 17:30:07 -
"하필 대선 기간때"… MG손보 노조, ‘일부 영업 정지’·‘폐쇄형 가교 보험사’ 금융위 방안에 강력 반발
2025-05-13 17:17:31 -
'스테이블코인' 대선 이슈 선점나선 민주당… 윤여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
2025-05-13 16:50:19 - 2025-05-13 16:48:34
-
'네트워크 보안 강자' 엑스게이트, 양자로 퀀텀점프…"보안 고도화 집중"
2025-05-13 16: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