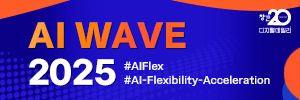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파괴적 혁신’ 품은 E3 게임쇼 개막
- 가
- 가

E3는 게임쇼 덩치로만 보면 독일 게임스컴은 물론이고 일본 도쿄게임쇼와 국내 지스타에게도 밀릴 정도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미국에서 열린다는 상징성을 가진데다 개최 역사도 1995년부터로 오래된 편이다. 주요 게임쇼 가운데 개최일이 가장 빨라 최신 유행을 먼저 접할 수 있다는 특징도 지녔다.

클라우드는 게임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기술이다. 중앙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시킨 뒤 이용자 단말기에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 사양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고품질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클라우드 게임이 초고속·초저지연의 강점을 가진 5세대(5G) 통신 활성화와 맞물리면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1월 월 9.99달러에 스타디아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준비될 타이틀은 발더스게이트3와 데스티니2:쉐도우키프 등을 포함한 30종을 E3 사전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클라우드? 전시 현장과는 온도차 있어=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참전을 알렸다. MS가 내놓을 엑스클라우드(xCloud)도 스태디아와 같은 서비스다. 전시 현장에서 클라우드 게임은 엑스클라우드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게임의 최대 약점인 반 박자 굼뜬 조작속도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체험대수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몰려 주어진 게임 1종만 즐길 수 있었다. 속도감을 요구하는 액션 장르는 아닌 까닭에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가 기대치가 높은 게임 마니아까지 만족시킬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3에선 일본 게임사들이 상당수 부각됐다. 소니의 빈 자리를 닌텐도가 채웠다. 웨스트(West)관 한쪽 면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부스를 냈다. 간판 캐릭터 마리오 등을 활용한 게임을 전시했고 기업(B2B) 전시회였지만 일반 전시회로 볼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이 닌텐도 게임을 하러 몰렸다. 세가, 반다이남코 등도 부스를 냈고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2K, 유비소프트, 베데스다 등 서구권의 유력 게임사들도 대거 부스 참가했다. 2K는 사우스(South)관 입구 전면을 부스로 채웠다. 들어가자마자 2K의 간판 게임 ‘보더랜드3’를 볼 수 있었다.
<로스엔젤레스(미국)=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현장]“어르신, 온라인 예약 하셨어요?”...SKT 유심교체 방문해보니
2025-05-10 07:07:00 -
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2025-05-09 19:09:38 -
주니퍼네트웍스, 가트너 '데이터센터 스위칭 부문' 리더 선정
2025-05-09 17:41:02 -
[DD퇴근길] 김영섭號 KT, 통신 다음은 AI…"MS 협력 성과 가시화"
2025-05-09 17:25:15 -
연 6.0% 우대금리 혜택… 새마을금고 어린이 맞춤형 'MG꿈나무적금' 5만5천계좌 판매
2025-05-09 17: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