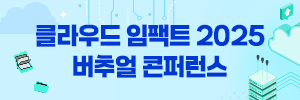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취재수첩] 고장 난 노트북과 서비스 혁신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잘 쓰던 삼성전자 노트북이 고장 났다. 정확히 말하면 키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Ctrl) 키가 부러졌다. 며칠 동안 덜렁거리더니 빠져버렸다. ‘복사(Ctrl+C)’, ‘붙이기(Ctrl+V)’ 작업을 마우스보다 키보드로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20만원 가량의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왼쪽 컨트롤 키가 따로 수리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품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키보드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방식이다. 물어보니 두께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6~7년 전부터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2011년 ‘센스 시리즈 9’이 나오면서부터인 것 같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성을 희생한 셈이다. 그러고 보니 잘 팔리는 노트북의 상당수가 2008년 나왔던 애플의 ‘맥북 에어’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애플은 제품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 가운데 하나다. 예컨대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무게와 두께가 불리해진다. 휴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혹은 더 높이면서) 사용시간과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리비가 늘어난다고 해당 업체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다. 제품 생산에 그만큼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에게 불리하다. 자가 수리로 잘 알려진 아이픽스잇(iFixit)이 명성을 크게 얻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필요한 부분만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 돈과 자원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이런 작업을 하기란 어렵다.
PC를 예로 들었지만, 한층 성숙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요즘 중고폰(리퍼비시)이 뜨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환급, 반품된 제품을 회수해 공장에서 재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은 자가 수리가 극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리퍼비시 제도를 기업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단점도 분명하지만, 수리가 어려워지고 당분간 극적인 혁신이 어려운 전방산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포인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쓰던 제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과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2025-04-17 08:20:39
-
[IT 빅매치] "바나나가 웃으면?"…AI 캐릭터는 이렇게 답했다
2025-04-17 07:00:00 -
AI로 가짜 쇼핑몰 뚝딱 만든다…"사기 수법 진화 중"
2025-04-16 20:00:00 -
최민희 의원,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 격상 개정안 발의
2025-04-16 18:17:07 -
뉴진스, 데뷔 1000일 자축했지만…법원 판단은 그대로
2025-04-16 18: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