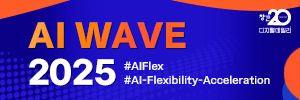내우외환 케이블TV, 돌파구는 어디에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연일 케이블TV 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한 때 뉴미디어 총아로 유료방송 시장을 석권했던 케이블TV지만 IPTV가 불과 몇년만에 턱밑까지 추격했다. 최근에는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SK로 넘어갔다. 수많은 케이블TV 업체 구심점인 협회의 수장은 임명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총선출마를 선언했다. 안팎으로 시끄럽고 미래도 불투명하다. 케이블TV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과연 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땅짚고 헤엄치기…권역보장이 경쟁력 떨어뜨려=케이블TV는 지역 사업자다.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에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다보니 과거 IPTV가 없던 시절에는 경쟁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면허만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도입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권역제한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전화 등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출로 케이블TV의 독점이 깨졌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오랜기간 권역독점의 달콤함에 빠져있을 뿐 다가올 냉혹한 미래에는 준비하지 못했다.
CJ헬로비전은 업계에서 가장 모바일에 역량을 쏟아부은 사업자였다. 1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에도 불구, 모바일이 없이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J그룹은 결국 CJ헬로비전을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에 매각했다. CJ헬로비전의 모바일 도전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업이 잘되고 미래가 밝다면 굳이 매각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업계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업계 1위 사업자의 매각소식은 업계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매각가격도 흔히 시장에서 통용되던 수준의 절반에 머물렀다. 케이블TV 업계가 처한 현실이 냉정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걸핏하면 낙하산…외풍에 휘둘리는 케이블=내부의 안일함도 문제였지만 외풍도 케이블TV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소다.
최근 윤두현 케이블TV협회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협회장에 부임한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올해 초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그의 협회행을 놓고 말이 많았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케이블TV 업계의 연구단체인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 원장에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임명됐다. 예산, 역할 등 이런저런 이유로 조직규모를 축소하고 업계 전문가를 원장에 앉히려했지만 결과는 180도 바뀌었다.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전관예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래부 역시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이 어떻게 연구원으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정권, 전직 공무원들이 요직을 차지했지만 케이블TV 위상은 높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소(SO 종합유선방송사)는 누가 키우나”는 유명한 사례다.
방통위 업무가 미래부, 신방통위로 나뉘어지면서 통신은 미래부, 방송은 방통위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진행됐지만 여야의 다툼속에 소(SO, 케이블TV)는 미래부가 키우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정치적 싸움에 정부조직개편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우리가 동네북이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누가 보냈던 간에 업계에 거부권이 있느냐”며 “자꾸 낙하산 운운하며 너희는 뭐하냐고 하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두현 회장의 총선출마 선언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것 아니냐”며 “기왕 낙하산이 내려올 거면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할 인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현장]“어르신, 온라인 예약 하셨어요?”...SKT 유심교체 방문해보니
2025-05-10 07:07:00 -
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2025-05-09 19:09:38 -
주니퍼네트웍스, 가트너 '데이터센터 스위칭 부문' 리더 선정
2025-05-09 17:41:02 -
[DD퇴근길] 김영섭號 KT, 통신 다음은 AI…"MS 협력 성과 가시화"
2025-05-09 17:25:15 -
연 6.0% 우대금리 혜택… 새마을금고 어린이 맞춤형 'MG꿈나무적금' 5만5천계좌 판매
2025-05-09 17: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