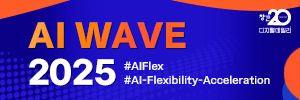[창간특집-창조경제와 ICT①] 창조경제 생태계, ICT가 핵심
- 가
- 가

‘창조’가 대세인 시대다. 정권과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의 슬로건도 변화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을,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라는 슬로건을 꺼내들었다.
과학기술과 ICT를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8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그리는 창조경제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ICT의 역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녹색’이었다. 녹색성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녹색국가를 건설하겠다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정책에 녹색을 주입시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녹색’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 녹색 전략을 진두지휘하던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그 위상이 현격히 떨어졌고 녹색성장기획단은 폐지되기도 했다.
그렇게 사라진 ‘녹색’은 ‘창조’로 대체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외교, 국방, 문화, 행정 등 범 부처가 창조경제 구현을 외치고 있다. 기존 정부에서 시작한 모든 프로젝트에 ‘창조’가 덧씌워지고 있다. 부처는 물론, 민간기업, 연구소 등도 ‘창조’를 외치고 있다. 바야흐로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3년 대한민국을 장악한 ‘창조’. 사전적 의미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니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발상은 그럴듯한데 사실 개념은 모호했다.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할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창조’에 적응하지 못했다. ‘창조’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과거 ‘혁신’, ‘녹색’ 자리를 그냥 ‘창조’로 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서서히 창조경제의 개념이 갖춰져 가고 있다. 창조가 신이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창조경제 개념과 관련해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화했고 이제는 지식사회로 진화하고 있는데 바로 지식사회가 창조경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학적인 발견부터 디자인, SW, 창작활동, 콘텐츠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적활동이 바로 지식창조 활동이고 산업에 접목하는 것이 바로 지식창조산업”이라며 “창의와 혁신 역량을 넣어서 지식창조산업을 만들고 창의를 결합시켜 전통산업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덧붙였다.
즉, 완전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창작활동 부터 기존의 것들을 결합,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것들을 고도화 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이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과거 정권들도 모두 추진해왔던 것들이다. 거창한 개념 때문에 정권 초기 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부도 거창하게 포장하기 보다는 기존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벤처 창업 지원이나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필요했던 출구전략이나 SW 제값받기 등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필두로 부처간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이달 말 경 발표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산업 통한 성장동력 ▲글로벌 인재 양성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6개 주요 전략에 200개 세부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 없었던 과제들도 등장하겠지만 6개 전략은 이전부터 추진돼왔던 정책이다. 창조경제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실패를 보완하고 현 산업 생태계에 맞춰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해외서도 응급의료 상담 가능”…LGU+, 소방청과 '안전·연결' 캠페인 진행
2025-05-11 12:00:00 -
[인터뷰] 의사 가운 벗고 AI 입다…실리콘밸리 홀린 ‘피클’
2025-05-11 11:55:43 -
[OTT레이더] 강하늘X고민시의 쓰리스타 로맨스, 넷플릭스 '당신의 맛'
2025-05-11 11:54:28 -
SKT 유심 교체 고객 143만명…6월 말까지 1077만장 유심 확보
2025-05-11 11:54:16 -
농협금융, "녹색금융 전략 강화"…ESG추진협의회 개최
2025-05-11 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