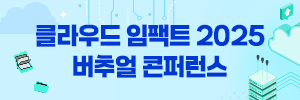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취재수첩] 통신비 인하 논란, 정치적 포퓰리즘 경계해야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전셋값, 기름값 등 물가가 치솟고 있자 범정부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비가 서민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으로 보인다.
최근 전셋값, 기름값 등 물가가 치솟고 있자 범정부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비가 서민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초당과금제 도입, 문자메시지 및 데이터 통화료 인하, 결합상품 등을 통해 계속해서 요금을 내려왔는데 이제와서 높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사들의 음성매출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역사는 PCS 사업자 등장 등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 더 컸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통신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확보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주도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통신비 인하 이슈는 선거철, 물가안정 등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았다. 어느 정당,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때만되면 요금인하를 거론해왔다.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이동통신 요금은 대중적 인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시장과 산업발전,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으니 요금을 인하하라는 식이었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은 사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에 다양한 기능이 접목됐기 때문이다. 과거 음성통화, 문자만 보내던 휴대전화가 지금은 인터넷, 금융결제, 문화생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똑똑한 기기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통신비와 문화비, 금융결제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통신비가 비싼지 싼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단위별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요금이 내릴 여력이 있다면, 내려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정부의 손목 비틀기가 아니라 온전한 경쟁구조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MVNO를 비롯해 새로운 신규 사업자 발굴, 보조금 중심의 경쟁구도를 요금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느것 하나 제대로하지 못한 정부가 스마트폰, 결합상품 등으로 알아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전셋값, 기름값 등 물가가 치솟고 있자 범정부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비가 서민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으로 보인다.
최근 전셋값, 기름값 등 물가가 치솟고 있자 범정부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비가 서민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초당과금제 도입, 문자메시지 및 데이터 통화료 인하, 결합상품 등을 통해 계속해서 요금을 내려왔는데 이제와서 높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사들의 음성매출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역사는 PCS 사업자 등장 등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 더 컸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통신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확보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주도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통신비 인하 이슈는 선거철, 물가안정 등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았다. 어느 정당,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때만되면 요금인하를 거론해왔다.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이동통신 요금은 대중적 인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시장과 산업발전,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으니 요금을 인하하라는 식이었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은 사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에 다양한 기능이 접목됐기 때문이다. 과거 음성통화, 문자만 보내던 휴대전화가 지금은 인터넷, 금융결제, 문화생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똑똑한 기기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통신비와 문화비, 금융결제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통신비가 비싼지 싼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단위별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요금이 내릴 여력이 있다면, 내려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정부의 손목 비틀기가 아니라 온전한 경쟁구조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MVNO를 비롯해 새로운 신규 사업자 발굴, 보조금 중심의 경쟁구도를 요금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느것 하나 제대로하지 못한 정부가 스마트폰, 결합상품 등으로 알아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라인망가, 日 앱마켓 매출 1위…‘여신강림’, ‘연애혁명’ 드라마 러브콜도↑
2025-04-09 17:53:48 -
올해 국가전략기술 R&D에 6.4조 투입…세액 공제 등도 추진
2025-04-09 17:10:57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산불 피해 전방위 지원… 재해자금 2천억원, 자원봉사 4천명 등
2025-04-09 17:09:34 -
나무기술, 가상화 신제품으로 ‘VM웨어 대안’ 출사표…“기능·가격 모두 자신”
2025-04-09 17:08:35 -
[DD퇴근길] 카카오엔터 매물로?…노조 반발에 카카오 대답은
2025-04-09 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