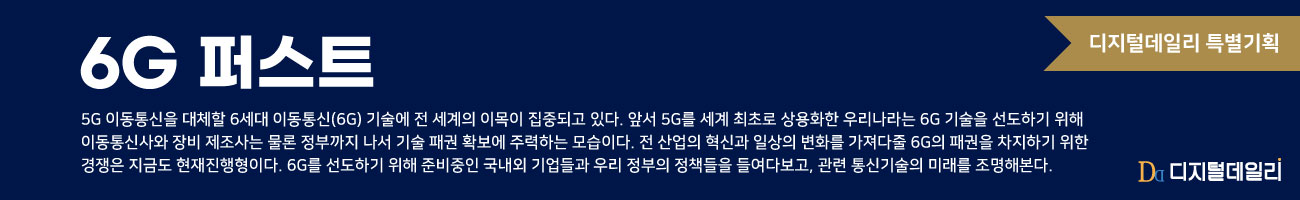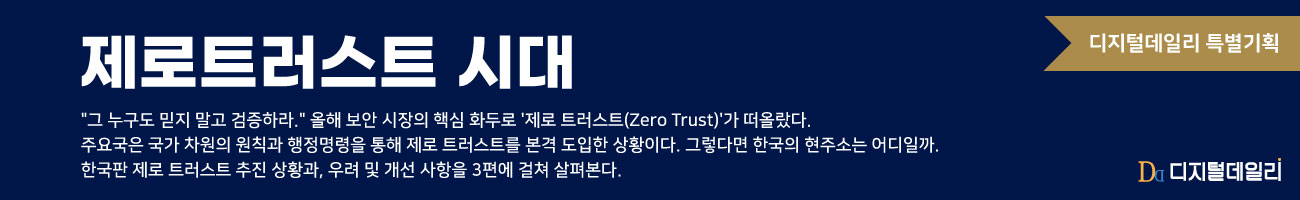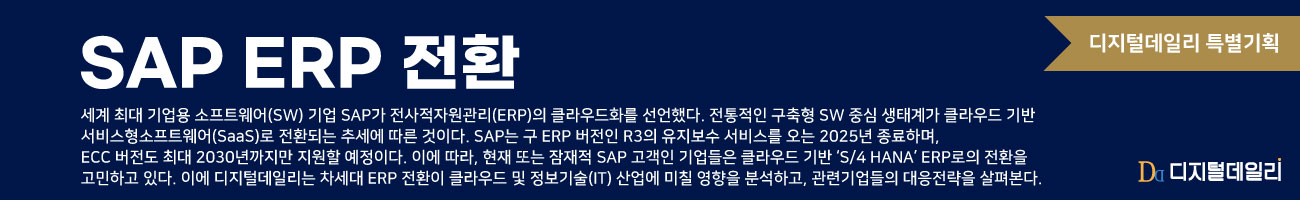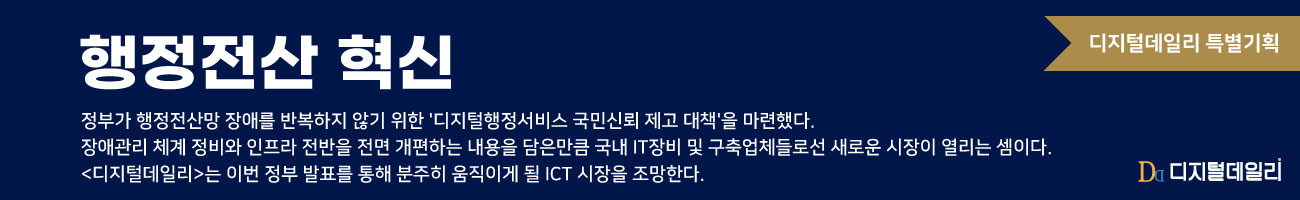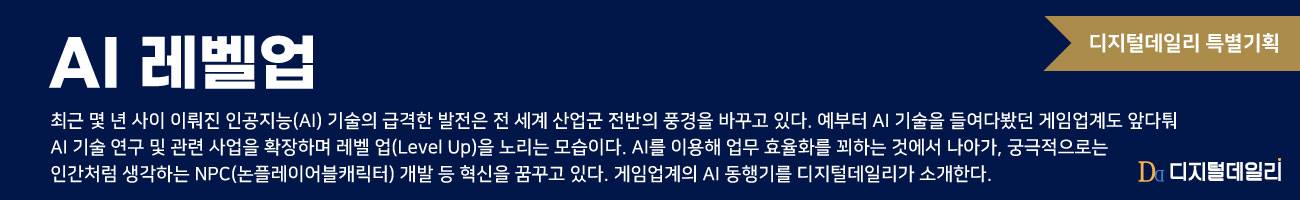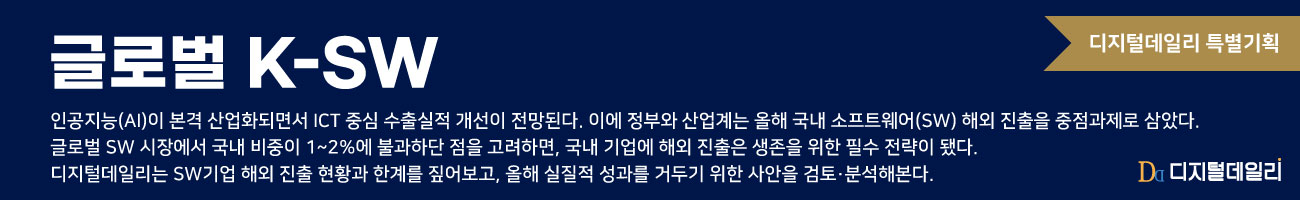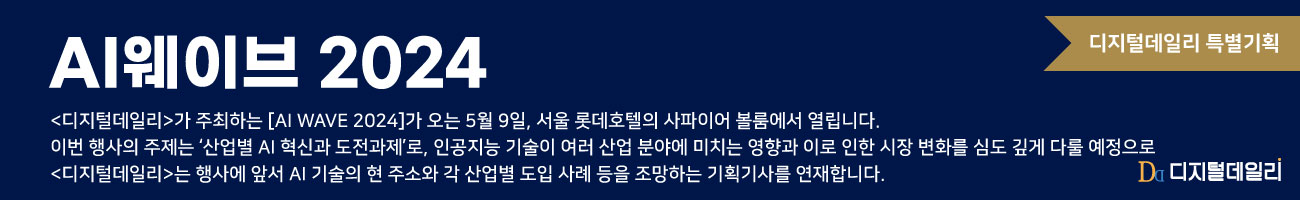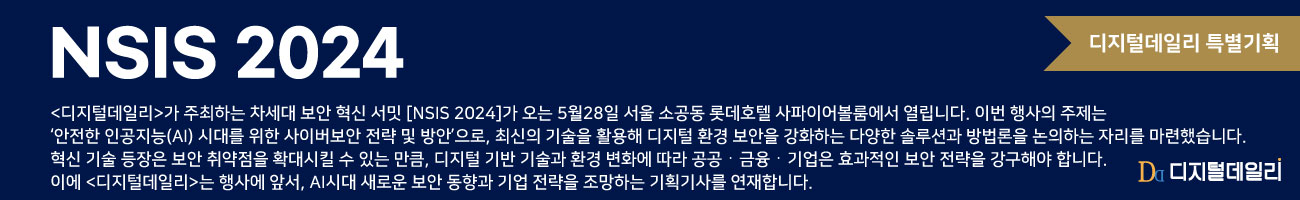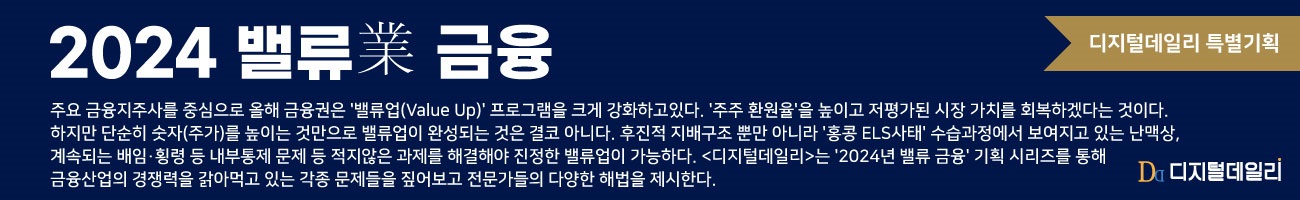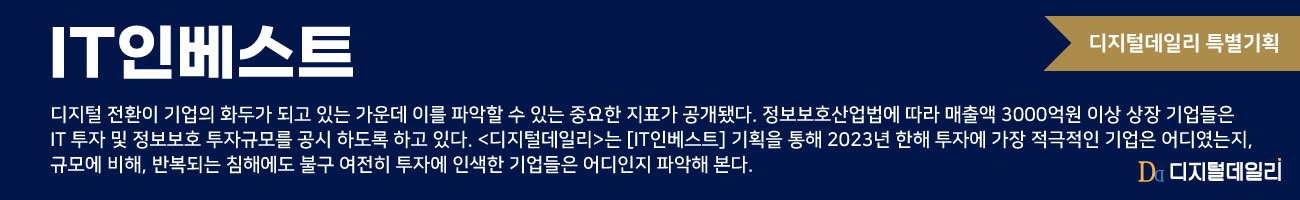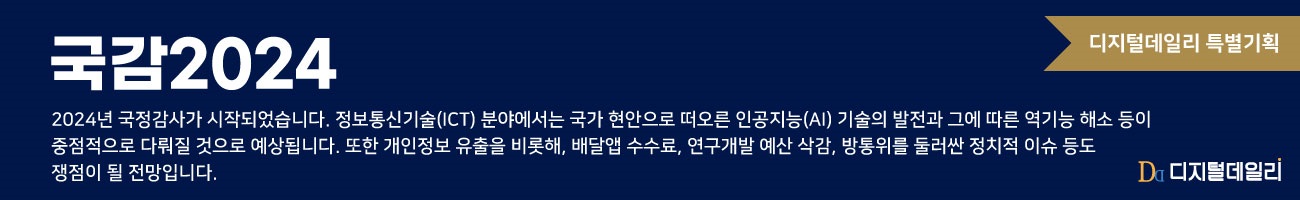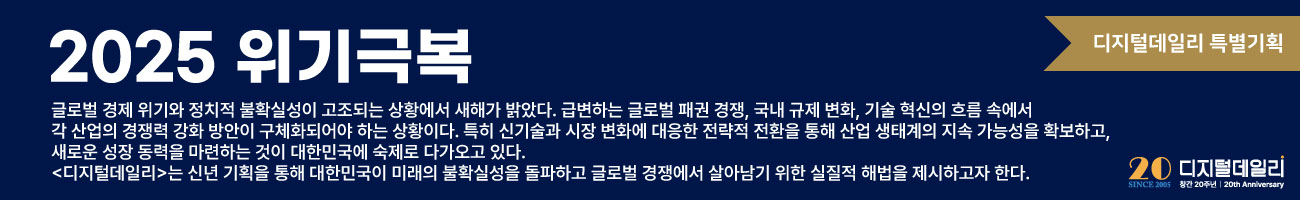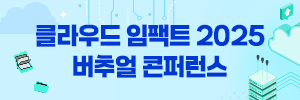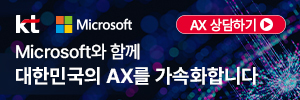[IT클로즈업] 금융사 알뜰폰 전략 ‘대동소이’…“매출보단 데이터가 실익”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최근 우리은행은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하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 대열에 합류했다. KB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이은 세 번째 금융사 알뜰폰 진출이다. 우리WON모바일도 기존 금융사 알뜰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금융-통신 서비스 시너지로 기존 통신 업계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각종 금융 혜택과 통신 서비스 시너지를 통해 이용자 저변 확대에 집중한다는 점, 확보한 이용자를 토대로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이용자 원천 데이터를 수집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 대부분 전략에서 이전 금융권 진출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토스·리브엠·우리…같은듯 다른듯 전략 ‘눈길’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인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 크게 보면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 출시 직후 전략과 가장 닮았다.
금융상품과 결합할인 및 우대금리 혜택 적용 등 금융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요금제 혜택을 선보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모두 5대 시중은행 사업자이기에 가능한 각종 금융 결합 혜택을 무기로 내세웠다. 전자금융업자인 토스모바일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경우 직접적인 금융상품 결합 혜택보다는 토스페이 결제 때 10% 페이백 등 혜택을 선보인 바 있다.
우리WON모바일은 요금제 측면에서는 여느 알뜰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라인업을 준비한 모습이다. 22일 기준 우리WON모바일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우리WON LTE 1기가바이트(GB)’로, 할인 적용 기준으로 월 4700원이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우리WON 직장인 5G 125GB+’는 할인 적용가 3만8800원 수준이다.
‘직장인 요금제’는 우리은행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서비스로 우리은행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큰 폭으로 할인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은행 연금상품 보유자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금융서비스 이용자 ▲예적금 상품 보유자 경우에도 금융실적 등에 따라 요금제 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가족·친구 결합 혜택까지 더하면서 은행 사업자만 구사 가능한 마케팅 전략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비대면 개통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점에서는 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 우리WON모바일 모두 같다. 세 사업자 모두 이용자에게 빠른 개통을 약속함과 동시에 100% 온라인 개통을 통한 편의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다.
플랫폼 전략 측면에서 기존 ‘우리WON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스모바일과 유사한 ‘원앱’ 전략을 택했다. 기존 플랫폼과 통합으로 이용자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것이다.
토스모바일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인터넷뱅크·보험·모바일 등 모든 서비스를 ‘토스’ 앱 하나로 통합하는 원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23년 독자 앱을 출시한 바 있다.
관련해 우리은행 측에서도 출시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잠금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은 그닥…진짜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
금융권의 통신사 진출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금융 수익 외 다양한 매출원 확보 목적이 있다. 금융권 특성상 지나치게 예대마진 등 금융 수익을 취할 경우 여론과 정부로부터 각종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 때문에 비금융 사업을 통한 매출 확장은 금융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신 사업의 경우 금융사에게 있어 당장의 매출 확보 행보라고 보기 어렵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23년 113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알뜰폰 사업은 5년 경과 이후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저렴한 망 사용료를 필두로, 일반 MNO 사업자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치열한 알뜰폰 시장 경쟁에 따른 미진한 이용자 확대 추세에 실적 개선도 요원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알뜰폰 진출을 지속하는 것은 비금융 매출 확장보다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융권 디지털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은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 망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권 내 AI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점차 확장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각종 AI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그룹의 데이터 확보 전초기지로써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금융그룹 전체 데이터 시너지로 봤을 때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 행사에서 “금융사는 알뜰폰 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기존 통신사와 협업 없이 소비자와 접점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사는 금리 우대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멤버십으로 묶어둘 수 있고, 그에 따라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의 가치로 인해 현재보다 금융사의 알뜰폰 요금제가 더 싸질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2025-04-22 12:07:02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조사 추진…"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2025-04-22 11:39:36 -
‘바니와 오빠들’ 드라마화에 웹툰 OST까지 뜨자… 뮤직카우 '함박 웃음'
2025-04-22 11:37:55 -
쿨리지코너, 'CCVC 부산 지역 혁신 펀드' 결성… 산은·부산시 등 135억원 출자
2025-04-22 11:09:45 -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온큐와 아시아 양자컴퓨팅 시장 공략
2025-04-22 1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