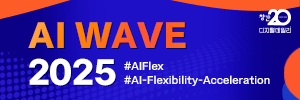국내 OLED 업체 유혹하는 中…거세진 디스플레이 굴기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중국 패널업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업체와 자국 지방 업체 간 합작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OE, 티안마, CSOT(차이나스타) 등 중국 패널업체는 OLED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외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실제 양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패널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이전보다 더 교묘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한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BOE는 국내 업체와 공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지 소재업체와 합작 법인 설립을 유도한다. 설계자산·특허(IP)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등 위험이 상당하다”며 “결국 내수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의도다. BOE의 경우 정부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티안마, GVO, CSOT 등 회사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7월 국내 OLED 재료기업 머티어리얼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중국 LTOPTO와 합작설립한 LTMS에서 적색 프라임 재료를 생산해 중국 최대 패널업체 A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A사가 어딘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BOE로 파악하고 있다. LTOPTO는 BOE의 청두 OLED 공장 B7에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OLED 원료 생산업체다.
이를 놓고 중국 패널업체가 대놓고 기술을 흡수하지 않고 교묘한 위장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 합치려고 하기보다 협력사 및 관계사와 합작하도록 유도해 기술력 확보를 꾀하는 식이다.
한국 인력 유입도 협력사를 통해 이직을 권고하는 등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OLED 기술자 A씨가 중국 BOE 협력사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로 이직한 사실이 세간에 밝혀지면서다. 당시 수원지법(민사31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업계에선 이미 중국 측이 국내 소재 업체뿐 아니라 장비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업체 등 업계 전반을 오래전부터 물색해왔다는 얘기가 익히 알려져 있다.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업체와 합작법인을 유도하는 식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찍이 중국 쪽에서 M&A(인수합병) 하자는 얘기도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국내 중소 메모리 반도체 업체 피델릭스는 이미 지난 2015년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2015년 4월 동심반도체 유한공사와 84억8000만원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최대주주가 기존 안승한 대표 외 2인에서 동심반도체로 최종 변경됐다.
동종업계인 제주반도체도 지난 2015년 중국 기업에 넘어갈 뻔 했다. 2015년 8월 중국 영개투자유한공사와 약 381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10월 16일 이 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양사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회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제주반도체는 작년 1월 대만 파운드리 업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와 60억원 규모의 LPDDR4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도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MC는 중국 푸젠성과 함께 D램을 제조하는 합작 법인을 세운 바 있다. 제주반도체는 작년 신규 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고급 인력을 대거 충원했다. UMC가 제주반도체에 개발 용역을 준 이유가 LPDDR4 개발 경험을 보유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우수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중화권 반도체 굴기의 ‘조력자’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도 일본, 독일 등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해 기술을 도입했던 만큼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통신3사, 비용통제로 영업익 사수…“AI 수익 가시화 시동”
2025-05-12 18:54:16 -
AI 사라진 SKT 컨콜, 2분기 어쩌나…“본원적 경쟁력 강화 집중”(종합)
2025-05-12 18:49:23 -
라이즈, 엠넷플러스 오리지널 예능 '숨바꼭질' 세 번째 플레이어로 출격
2025-05-12 17:54:22 -
구글, 또 다시 지도 반출 요청…“국가 경쟁력 위태” 산업계·학계 우려
2025-05-12 17:53:33 - 2025-05-12 17:32:36